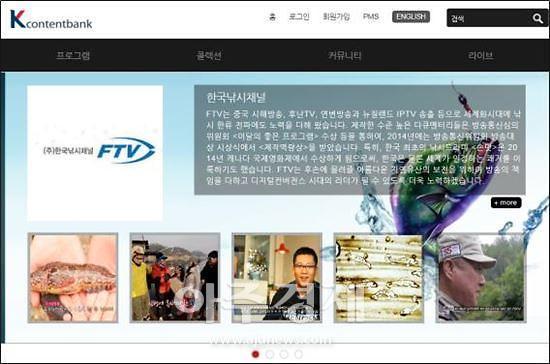
K콘텐츠뱅크 첫 화면.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발표한 최소 5개 이상 플랫폼의 해외 진출 지원은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를 담을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GAFAN)에 맞설 수 있게 우리 기업들이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결국 OTT의 몸집을 키우는 데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망과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한 뒤 콘텐츠가 마구 쏟아지자 부족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플랫폼을 만들게 된 구조"라며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알고리즘은 너무 구식이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주도한 '한국형' 사업의 실패 사례도 속속 언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형 유튜브'를 표방해 'K콘텐츠뱅크'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었다. 콘텐츠 판매·수출 활성화를 기대하며 만든 이 플랫폼에는 약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실제 K콘텐츠뱅크를 통해 판매된 콘텐츠는 출범 후 1년간 4건, 3000만원에 불과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양질의 한국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상업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힘든 구조였다"며 "당연히 일정 뷰 이상이면 수익이 생기는 유튜브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는 '한국형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310억원을 들였다.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정부발 '한국형' 사업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디지털 미생(未生)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한 관계자는 "정부 추진 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늦은 감이 있고 방향성도 따라가기 식이 많다"며 "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및 후속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9/20250109104729509983_518_323.jpg)
![[포토]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002008900920_518_323.jpg)
![[포토] 눈 내리는 제주항공 사고 현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7/20250107105645774286_518_323.jpg)
![[포토] 개막 앞둔 CES 202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6/20250106203539844914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