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덟 번의 위기' 원톄쥔 지음 | 김진공 옮김 | 돌베개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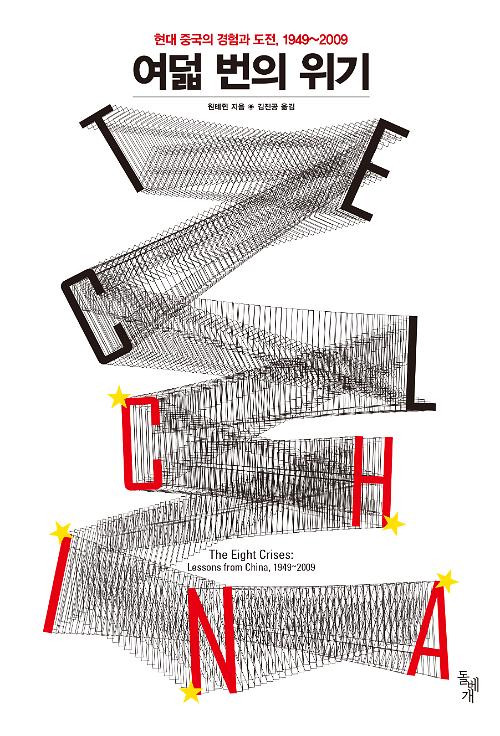
'여덟 번의 위기' [사진=돌베개 제공]
'여덟 번의 위기'는 1949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이 겪은 위기, 즉 외자·외채 도입, 개혁·개방,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둘러싼 문제들을 다룬다. 무려 여덟 번에 이르는 경제 위기를 중국이 경험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선 중국의 속살은 더더욱 베일에 가려 있었다.
당·정부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구 자본주의 체제나 자유주의와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 온 원톄쥔은 오랫동안 국내외 현장에서 일하며 중국·세계 경제의 실상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지난 위기를 예리하게 톺아본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서구의 현대화와 도시화로 대표되는 발전 경로로 설명될 수 없는 특징과 메커니즘을 지녔다"며 "그 경로를 똑같이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향촌사회'에 주목한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수천만 명의 농민공들이 되돌아갈 농촌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노동력과 자본의 거대한 저수지인 향촌사회가 위기를 연착륙시키는 매개체가 됐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중국발 경제 위기는 세계의 위기이자 한국의 위기라는 점에서 원톄쥔의 현대 중국 진단은 곱씹어볼 만하다.
428쪽 | 1만9500원
◆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로데베이크 페트람 지음 | 조진서 옮김 | 이콘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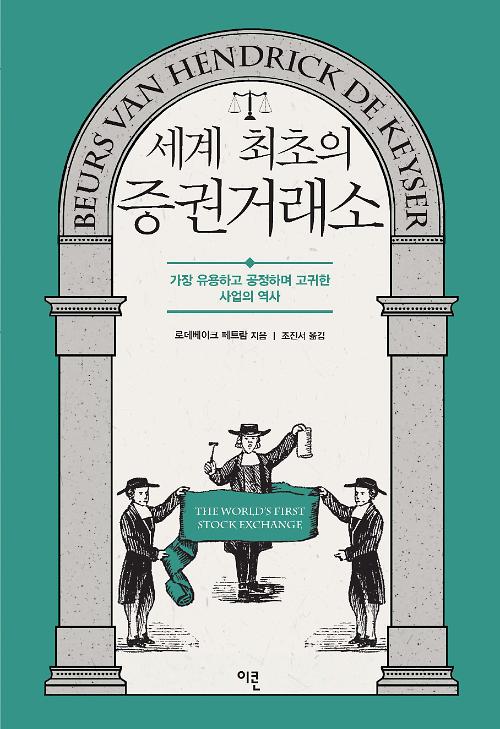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사진=이콘 제공]
"(투기꾼들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으면 주식 생각을 하는 거였고, 뭔가 먹고 있다면 그것도 주식투자에서 나온 거였다. 공부를 하면 주식에 대한 공부였고, 항상 주식에 대한 환상을 꿈꿨다. 병들어 죽는 자리에도 주식 걱정만을 했다."(본문 31쪽)
옵션, 선도 거래, 리스크, 작전, 무차입 공매 등의 용어가 난무할 뿐만 아니라 마켓 메이커, 브로커, 트레이더라는 전문직들도 활개를 치고 다닌다. 주식을 사고팔아 대박을 친 사람도 있고, 쪽박을 찬 사람도 부지기수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밤이 되면 골목길을 밝히는 호롱불 몇 개를 빼고는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져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형수들의 몸뚱이가 교수대에 대롱대롱 걸려 있던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이야기다.
1602년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를 기반으로 암스테르담은 조그만한 상업도시에서 유럽 전체의 금융허브로 성장했다. VOC는 세계 최초로 회사의 지분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증권'을 발행했고, 그 이후 암스테르담 사람들은 이 새로운 증서를 사고팔기 시작했다. 단순 매매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사고파는 날짜를 지정하고 먼저 거래를 하기도 했으며, 거래의 권리에 가격을 붙여 사고팔기도 했다. 선물, 옵션, 공매도같은 복잡한 거래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 책은 '주식' '거래' 등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인 17세기에 시작됐다는 사실 외에도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거래소가 어떻게 17세기 이후 서유럽을 패권국가로 만들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저자는 파생상품과 선도거래의 태생, 옵션과 환매조건부채권의 유래 등을 네덜란드 전역의 문서보관소를 뒤져 공문서부터 개인간 편지까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풀어낸다.
한국 최초 증권거래소, 19세기 VOC·네덜란드·조선 역사 비교 연표, 책 속 주요장소가 표시된 지도 등 한국어 번역본에만 있는 자료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376쪽 | 2만원
◆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지음 | 동아시아 펴냄

'김상욱의 과학공부' [사진=동아시아 제공]
수많은 공식과 법칙 외우기. '과학적 사고방식' 하면 으레 따라붙는 행위들이 아닐는지. 그렇지만 '과학은 결국 인간과 세계를 들여다보는 학문'이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과학적 사고방식은 곧 철학이고 인문학이다.
'양자역학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상욱 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는 "과학은 지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학은 합리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고, 그 속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과학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비과학적인 것은 '비인간적인 것'이다.
이 책은 과학 지식을 심층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으로서의 과학을 가까이 불러온다. 과학을 기술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과학은 사고방식이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인문학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려는 저자는 "인문학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과학도 정치, 사회, 문화 등 실제 세상에 적용될 때 해결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과 인문학을 같은 출발선에 둘 때 그 둘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의 이치'라는 뜻의 '물리'(物理)에 천착하는 학자답게 저자는 빈틈없이 문학, 사회, 역사, 윤리 등을 훑어 나간다. 이 책의 부제가 왜 '철학하는 과학자·시를 품은 물리학'인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336쪽 | 1만6000원







![[날씨] 아침 기온 뚝, 영하권 추위…바람 불어 체감온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175459225687_388_136.pn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오데마 피게 포토콜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205657914816_518_323.jpg)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518_323.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518_323.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