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숙(63)씨가 흰 옷을 입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임종현 수습기자]
"얘들아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31일 오전 11시 30분 이인숙씨(63)는 흰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조문을 위해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분향소를 가득 메웠다. 그녀는 '얘들아 미안하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큰 한숨 소리와 함께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렇게 1분간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에게 하염없이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힌 그는 이 시대의 어른이자 엄마였다.
이씨는 아이들이 좋은 곳에 갔으면 하는 마음에 흰 옷을 입었다고 말했다. "우리(어른이)가 왜 진작 안전 수칙을 바꾸지 못했는지...", "질서 유지를 했어야 했다, 누군가는 어디서든 했어야 했다" 등 애들은 축제에 놀러간 것뿐이지 죄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완섭씨(68)는 이곳 합동분향소에 오기 위해 오전 9시 30분 차를 타고 1시간 30분을 달려왔다. "평택에는 분향소가 없어서 국화를 사서 이곳을 찾았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최씨는 "경제 발전 해서 뭐하냐, 젊은 애들이 죽었는데..."라고 말하며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두 눈을 가렸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다.
최씨는 "여기 계신 똑똑하신 분들(기자)이 뭐라 말 좀 해봐요"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정적이 흘렀다. 20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누구도 쉬이 입을 열지 못했다. 최씨는 "교통정리만 했어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시민들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김서현 수습기자]
최병옥씨(70·경기 의정부)도 한 아이의 할아버지다. 그는 손이 떨려서 방명록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꿈을 다 펼치고 가지 못한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도 못다 핀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로 미처 쓰지 못한 글을 갈음했다.
자신의 또래인 20대를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도 있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정원우씨(26)는 경기도 광주에서 6시 전철을 타고 이곳을 찾았다. 그는 헌화한 뒤 다리를 휘청거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서서 절을 두 번 한 후,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한 채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다.

31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은 정원우(26)씨가 조문하고 있다. [사진=김서현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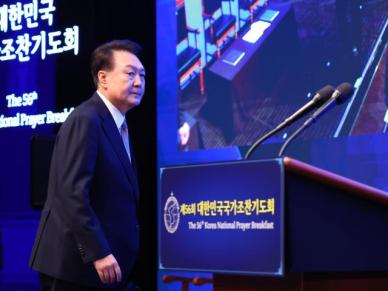




![[포토] 눈 쌓인 덕수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082949997862_518_323.jpg)
![[포토] 화성시 화재현장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123450357646_518_323.jpg)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5229136612_518_323.jpg)
![[포토]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0609985611_518_323.jpg)



고맙지는 않나요?
저런 부류들 특징이 사회초년생인 부하직원한테는 어른답게 굴어라하면서 저런데서는 어른들 잘못이야하는 이중적인 모습보임
가슴아픈 일이고 서울시 한가운데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다는게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애도기간동안 분양소까지 가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저기는 조문하는 곳이지 본인 하고 싶은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본인 장례식에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며 난동피우면 기분이 어떨꺼 같나요? 제발 자중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