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윤희 무의협동조합 이사장]
뉴질랜드 총리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식 중계방송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기념식 끝 부분에 만세삼창이 있었다. 마지막 즈음 한 청년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국민들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겠습니다”라면서 수어를 선보였다. 그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다.
그때 비로소 해당 TV채널에선 수어통역이 없음을 깨달았다. 통상 KBS 등 공영방송에선 화면 하단에 별도의 수어통역 화면이 지원되지만, 다른 채널에선 수어통역 화면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그것을 중계하면 굳이 방송사마다 수어통역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청각장애인(농인)을 위한 손짓 언어를 예전에는 수화라고 불렀다. 그런데 요즘엔 ‘손으로 하는 언어’, 즉 ‘수어’라고 바꿔 부른다. 영어로도 청각장애인 언어는 ‘Sign Language’라고 부른다. 수어도 엄연한 언어이기에 청각장애인들 사이에는 고유의 수어 문화도 있다고 한다.
휠체어를 타는 딸이 있다 보니, 필자는 장애 차별에 민감하다. 노골적으로 차별하거나 열등하게 보는 것만 차별이 아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때로는 차별이다.
일례로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면,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출하기도 힘든데 뭐하러 데리고 나왔어. 집에나 있지. 쯧쯧”하며 혀를 차는 어르신들이 있다. 학교에선 아직도 휠체어 탄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 가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쉬게 하면 어때요”라고 무심하게 말한다. 욕만 하지 않았을 뿐, 장애인도 동등한 이동권이 있음을 망각한 차별적 발언이다.
그런데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들을 만나면서 점점 눈이 트이게 됐다. 단순히 장애를 차별하는 게 나쁘다는 인식 수준에서 벗어나, 장애를 ‘다름’으로 인식하게 됐다. 더 나아가 수어가 어떻게 하나의 언어가 되었는지 이해하게 되면서, 장애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어떤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문화집단으로 존중한 사례가 바로 뉴질랜드 총리의 기자회견 장면이 아닐까 싶다.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며 수어를 한 청년의 이야기는 청각장애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대단한 화제였다. “그런 공식적인 국가 행사에서 화면 정중앙에 수어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란 반응 일색이었다.
주최 측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청년이 즉석에서 한 행동이 잔잔한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선 수어가 당당한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여진 듯한 일대 사건이었던 것이다.
우리도 앞으론 중요한 발표나 기자회견 시 대통령 옆에 자리한 수어통역사를 볼 수 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을 비장애인이 동정하고 배려할 대상이 아닌, 그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동등한 사람으로 자연스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도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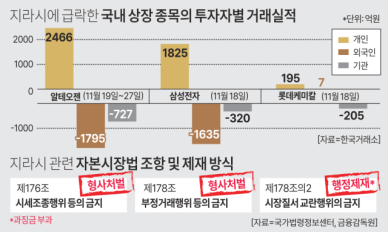
![[2024 스마트대한민국대상]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디지털 전환은 곧 생존과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00558328826_388_136.jpg)
![[단독] 저축은행 사태 투입한 공적자금···정리도, 회수도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34144932955_388_136.jpg)

![[포토] 올해 마지막 금통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8/20241128093240100440_518_323.jpg)
![[포토] 눈 쌓인 덕수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082949997862_518_323.jpg)
![[포토] 화성시 화재현장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123450357646_518_323.jpg)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522913661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