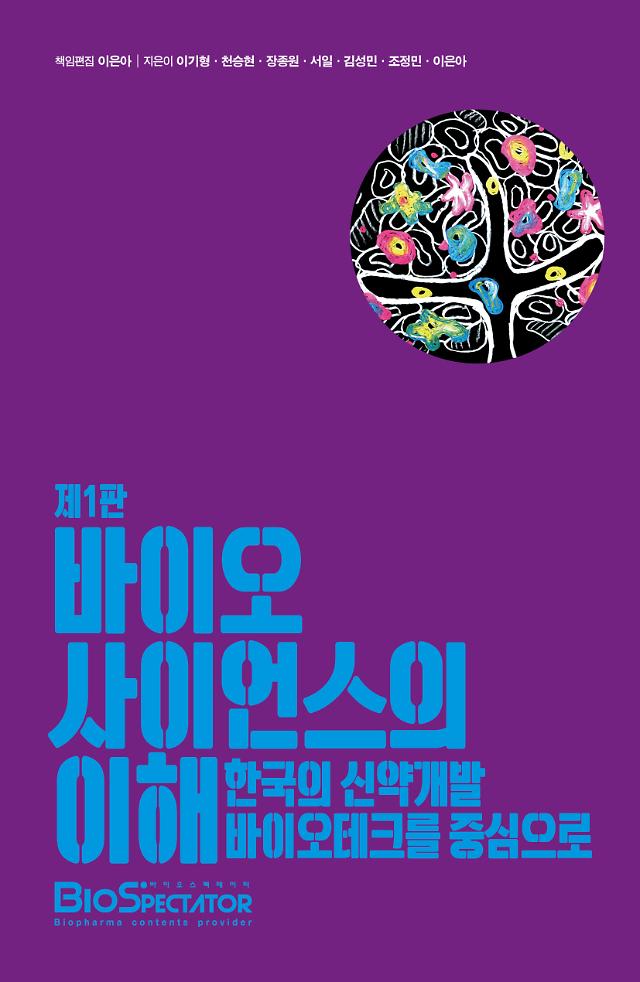
'바이오사이언스의 미래' [사진=바이오스펙테이터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2015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흑색종(피부암의 일종으로 미국에서 발병률 6위일 정도로 대중적인 암)에 걸렸고, 이미 뇌까지 전이돼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렇지만 카터는 2017년 현재까지 민주주의, 인권, 세계 보건 증진 등과 관련한 활동을 꾸준이 이어오고 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바이오사이언스의 이해 - 한국의 신약개발 바이오테크를 중심으로'는 키트루다 같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이야기를 다룬다. 바이오·제약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전현직 기자 7명은 지난 1년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을 함께 썼다.
저자들은 바이오 의약품의 주를 이루는 단백질 의약품을 비롯해 면역 치료,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조기진단, 동반진단, 맞춤 정밀의학, 첨단 과학기술, 치료제 개발 현황 등 한국의 바이오사이언스를 톺아본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은 현재 연구자·개발자가 중심이 된 300여 개의 바이오테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약품이 개발한 '랩스커버리'는 환자의 몸으로 들어간 의약품이 오래 남아 있게 만드는 기술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 대형 제약기업에 총 9건(10조 원 규모)을 수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기술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분자 물질을 바이오 의약품에 붙여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체내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 최소 10년의 기간과 몇 조 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개발의 과정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이처럼 한국의 바이오테크들은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해 난치병과 암을 잡으려 하는지, 연 매출 수백 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적인 제약기업들과 한국의 바이오테크는 어떻게 경쟁하고 협업하고 있는지 등을 보여준다.

동반진단을 통한 치료 효능 향상을 설명하는 도판(본문 204쪽) [사진=바이오스펙테이터 제공]
저자들의 차분한 설명 덕분에 생명과학, 신약개발, 바이오 기술 등의 주제가 난해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선 '도판'이 등장한다. 이는 필자 중 한 명이 직접 칠판에 분필로 그린 것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해 실은 것으로, 실제 독자가 앞에 앉아 있다고 가정하고 말로 설명하면서 그렸단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바이오사이언스에 주목한 것일까?
이유는 명확하다. 암, 뇌질환, 만성질환, 유전질환, 희귀질환 등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과학으로 풀 수밖에 없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첨단 의약품 대부분은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2016년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암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30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 바이오사이언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첨단 바이오 의약품 처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0만 원이다.
이미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 삶, 그것도 생과 사의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다.
368쪽 | 2만5000원







![[사고] 제5회 스마트대한민국포럼 대상 27일 열립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4/20241124114930835280_388_136.pn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오데마 피게 포토콜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205657914816_518_323.jpg)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518_323.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518_323.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