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MB노믹스를 뒷받침하는 인물이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MB노믹스를 뒷받침하는 인물이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이다.지금은 MB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측근이지만, 이념과 색깔이 판이한 DJ, 노무현 정부에서 관세청장,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산업자원부 장관(현 지식경제부) 등 핵심 요직을 역임하면서 한국 경제의 명운과 궤를 같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2년 행시 12회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은 2003년말까지 30여년간 경제관료를 지내면서 유연한 처신으로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왔다.
외양에서 풍기는 소탈함과는 다르게 '뚝심'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외유내강형 이라는 평가다. 옛 재무부 과장 시절부터 그에겐 '진돗개'란 별명이 따라다녔다. 한번 손을 댄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보고야 마는 '끈질김' 때문이다.
YS정부 말기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일찍 감지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직보했던 일은 관가에서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1994년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을 거치면서 글로벌 경제동향을 꿰뚫었던 그가 거시·미시·국제경제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재정부 관료들은 지금도 YS 정부가 국제금융라인을 홀대하지만 않고, 윤 의원의 직언을 새겨들었다면 외환위기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나라당에 2007년 윤 의원이 들어온 것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것이었다. 10년간 야당에 머물렀던 탓에 당시 현직 관료들과 교분이 거의 없던 한나라당으로서는 윤 의원의 동참으로 공직사회와의 안정된 교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윤 의원의 경험과 인품을 잘 알고 있는 관료사회가 야당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안정을 회복한 계기가 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도 윤 의원 같은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회고했다.
MB 정부 출범의 일등 공신인 윤 의원은 이후 날개를 달았다.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을 시작으로 2008년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을 거쳐 2009년 1·19 개각 때 경제수석으로 중용됐다. 그해 8월31일 청와대 개편에서 '왕수석' '부대통령실장'으로 불리는 정책실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지난해 7·28 재·보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돼 초선 국회의원에 올랐지만, 그의 전력은 단순한 '초선 의원' 몇 배의 무게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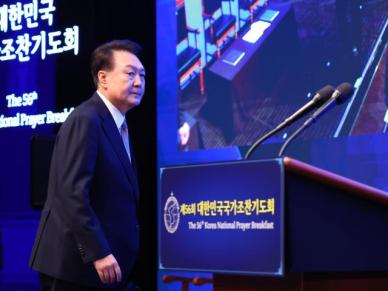




![[포토] 눈 쌓인 덕수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082949997862_518_323.jpg)
![[포토] 화성시 화재현장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123450357646_518_323.jpg)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5229136612_518_323.jpg)
![[포토]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060998561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