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그내 순례길의 시작 '솔뫼성지' 입구 [사진=기수정 기자]
가을의 청량함을 마음속에 머금고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기 좋은 길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자연의 숨결이 오롯이 살아 숨쉬는 듯한 이 길은 가라앉은 마음에 살며시 생기를 불어넣었다. 충남 당진 버그내 순례길은 그런 곳이었다.

솔뫼성지 안쪽에 자리한 김대건 신부 동상.[사진=기수정 기자]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1814년 순교), 종조부 김한현(1816년 순교), 부친 김제준(1839년 순교), 그리고 김대건 신부(1846년 순교)에 이르기까지 4대의 순교자가 이곳에서 신앙의 꽃을 피웠다. 김대건 신부도 박해를 피해 할아버지 김택현을 따라 경기 용인 한덕동(현 골배마실)으로 이사를 갈 때(일곱 살)까지 이곳 당진에 머물렀다.
용인 골배마실에서 신학생으로 간택된 김대건 신부는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1845년 상해 김가항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고 그해 10월 귀국했다.
귀국 후 용인 일대에서 사목을 하다가 1846년 9월 국문 효수형을 받고 40여차례의 모진 고문을 견디다 새남터에서 26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순교한 지 40일 만에 죽음을 피해 살아남은 이민식을 비롯한 신자들이 그의 시신을 비밀리에 빼내 이민식의 고향인 미리내(안성시 양성면 미산리)에 안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는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성인 품위에 올랐다. 그리고 2019년 11월 유네스코 제40차 총회에서는 김대건 신부를 2021년 세계기념인물로 선정했다.

합덕성당 전경[사진=기수정 기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지순례에 나설 차례. 당진에는 순교자들의 길이자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버그내 순례길이 있다. '한국의 베들레헴'으로 불린다. 지난 2014년 천주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찾으며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로 명성을 얻었다.
'버그내'는 삽교천으로 흘러들어 만나는 물길을 뜻한다. 합덕 장터의 옛 지명인 '범근내포'에서 유래했다.
서양 선교사들의 주 활동무대가 됐다. '내포'는 바닷물이 육지 깊숙이까지 들어와 포구를 이루어 배들이 드나들며 새로운 문물을 전파한 덕이다.
이 물줄기를 중심으로 천주교 신앙이 퍼져나갔다. 내포의 사도라 불리던 이존창 루도비코의 탄생지와 활동지였다. 앞서 언급했듯,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집안도 이곳에서 신앙을 꽃피웠다.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오롯이 스며든 고난의 길이다.
버그내 순례길은 주요 성역이 되는 솔뫼성지와 원시장·원시보 형제의 탄생지, 신리성지의 다블뤼 주교와 교우촌, 박해가 끝나고 탄생한 합덕성당 공동체로 이어진다.
순교자들의 아픔을 품었지만, 최근에는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비대면 여행지'로 더 주목받고 있다.
버그내 순례길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인지도는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지)로도 선정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바깥 활동에 갈증을 느낀 이들의 발걸음이 늘자 '걷고 싶은 길'에 이름을 올렸다.

솔뫼성지 내에 자리한 김대건 신부 생가 [사진=기수정 기자]
버그내 순례길의 시작은 솔뫼성지다. '소나무가 뫼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의 순우리말 '솔뫼'는 충청도에서 제일 좋은 땅 '내포' 한가운데 자리한 신앙의 못자리다.
솔뫼성당 입구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니 원형 공연장 겸 야외 성당인 솔뫼 아레나가 등장했다. 둘레에는 12사도가 세워졌다. 빼곡히 들어찬 솔밭 사이마다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조형물이 설치돼 있었다. 천주교 전파를 위해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모습이 성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순례길은 오름길이나 거친 길 없이 고요하고 평온했다.
주요 지점은 솔뫼성지를 시작으로 합덕제와 합덕성당, 원시장·원시보 우물터를 거쳐 무명 순교자의 묘를 경유해 신리성지까지 약 13.3㎞에 달하는 비순환형 경로로 이어진다. 이 길이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부터 이용됐던 순교자들의 길이다. 이 길을 모두 걷는 데는 대략 4~5시간 걸린다.
합덕 평야에 농업용수를 조달하던 저수지 합덕제를 지나니 합덕성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1929년 프랑스 선교사였던 페랭 신부가 봉헌한 합덕성당은 고즈넉한 합덕마을을 듬직한 자태로 지키고 서 있었다.

합덕성당 종탑[사진=기수정 기자]
100년쯤의 역사를 간직한 이 성당은 한국 천주교회에서 사제와 수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성소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다.
합덕의 너른 들에 가득 차 있는 기운을 받았고, 처절한 순교의 길을 택한 이들을 기억하며 구불거리는 길을 걸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람 부는 평야를 지나 조붓한 둑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저 머릿속을 정리하고 마음을 달래러 왔건만, 순교자들의 뿌리와 신념, 아픔, 뜨거웠던 영혼에서 위안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신념의 전파를 위해 피 흘리기를 택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품은 그 길은 참으로 숭고했다.
걷기를 끝낸 시간, 고개를 드니 어느덧 하늘은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옷깃을 스치는 바람은 가슴속 모든 근심을 실어나르는 듯했다. 하루는 짧았지만 여운은 길었다. 그날의 여정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달뜬다.

신리성지도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성지 중 한 곳이다. [사진=기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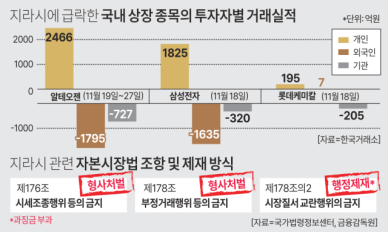
![[2024 스마트대한민국대상]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디지털 전환은 곧 생존과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00558328826_388_136.jpg)
![[단독] 저축은행 사태 투입한 공적자금···정리도, 회수도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34144932955_388_136.jpg)

![[포토] 올해 마지막 금통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8/20241128093240100440_518_323.jpg)
![[포토] 눈 쌓인 덕수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082949997862_518_323.jpg)
![[포토] 화성시 화재현장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123450357646_518_323.jpg)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522913661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