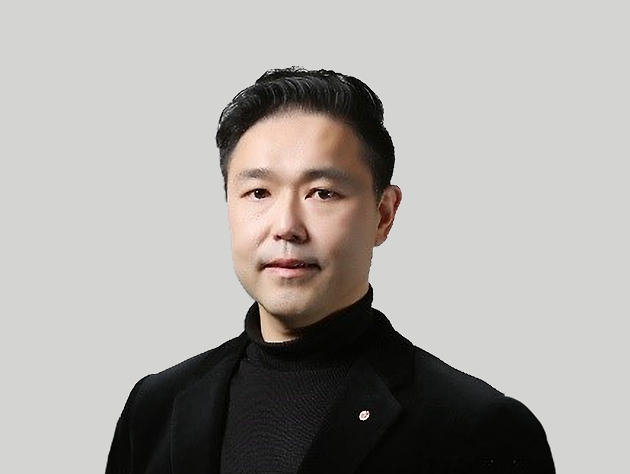
[사진=지속가능연구소 제공]
김 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1 GGGF)'에서 '친환경 허들 높이는 국가들'이라는 주제강연을 맡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을 근거로 2023년까지 각 국가의 환경보호 실천 점검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또 온실가스의 배출 규모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5년도부터는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의 판매도 EU서 금지한다.
김 소장은 탄소국경세의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면 한국의 경우에는 약 8조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라며 "이외에도 플라스틱세도 EU에서 올해부터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유럽과 미국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친환경이란 키워드를 앞세워 환경자원 및 정책의 허들을 높이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제도는 사회적 방향이자 신호등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부터 온실가스를 줄이자, 물을 아껴쓰자는 등 다양한 구호를 외쳤지만 별로 바뀌지 않았다"며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하고 플라스틱의 사용도 늘어났다. 자발적으로 약속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면서 제도와 규제가 만들어지고 환경운동에 동참하자는 구호가 생겨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가 허들로 작용할 것이란 생각만 하면 어렵게 다가온다"며 "제도는 국가와 시민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지표이고, 신호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친환경 제도가 새로운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값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고 생태계가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불과 10년에서 20년 후면 이제 우리에게 환경위기가 다가온다는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며 "국가와 시민·기업이 따로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목표를 세우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친환경이라는 장애물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날씨] 아침 기온 0도 안팎 뚝…일교차 15도 내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3/20241123161702152439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오데마 피게 포토콜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205657914816_518_323.jpg)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518_323.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518_323.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