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위에 둥둥 떠 있는 세 개의 인공섬들은 따사로운 가을볕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눈 앞의 세빛섬은 '전시행정의 상징', '한강의 흉물' 등 그간에 덮어 쓴 오명들이 무색해 보이는 듯 했다.
이미 몇 달 전 개장한 세빛섬의 레스토랑들은 만석이었다.
특이한 점은 세빛섬 손님 대다수가 40~50대 여성이란 점이었다.
세빛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점심 때 오는 손님 대부분은 강남에 사는 돈 있는 아줌마들"이라며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바라는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귀띔했다.
세빛섬이 '강남 아줌마'들 판으로 짜여진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레스토랑의 음식값과 불편한 교통편 때문이다.
세빛섬에 있는 뷔페는 저녁 식사의 경우 1인당 5만5000원이다.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긴 부담드러운 가격이다.
뷔페 뿐만 아니라 세빛섬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술집 등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더불어 차 없이 세빛섬을 찾는 길 또한 험난하다.
지하철로 고속터미널 역에 내려 도보로 15분 가량을 걷고, 차들이 오가는 지하보도를 건너야 세빛섬에 도달할 수 있다.
세빛섬은 애시당초 민간 자본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오롯이 공공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적으로 각종 혜택을 받아 완공된 만큼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되서도 안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빛섬 개장식에서 밝혔듯 세빛섬이 천만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 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세빛섬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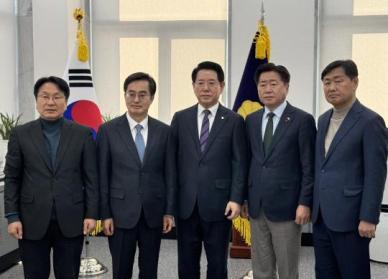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하며 행진하는 참석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201639295254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에 모인 5000여명의 성난 시민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48480510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32760229_518_323.jpg)
![[포토]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단체... 윤석열은 퇴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64296030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