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식 교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에게는 익숙한 ‘김중배 선언’이란 게 있다. 1991년 9월 6일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중배는 “언론은 이제 권력과 싸움보다, 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에 의한 언론 지배를 경고한 ‘김중배 선언’은 한국 언론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이후 언론은 그가 경고한 길목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은밀하고 노골적으로 자본권력과 결탁하며 진화했다.
영화 ‘내부자들’은 자본권력 앞에 무기력한 ‘김중배 선언’의 현실 버전이다. 영화 속에서 조국일보 논설위원 이강희는 미래자동차로 상징되는 자본권력과 한 몸이 되어 권력을 농단한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불리한 여론을 걱정하는 미래자동차 오 회장에게 이강희는 대중은 신경 쓸 것 없다고 한다. 이후 조국일보는 기사와 칼럼, 사설을 동원해 미래자동차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 대가를 챙긴다.
언론노조는 “썩은 암 덩어리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했지만 간단치 않다. 오래 전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우려했듯 언론과 자본권력 간 내통은 뿌리 깊다. 시민들이 쟁취한 민주화에 편승한 주류 언론은 자본권력과 야합하며 몸집을 키웠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아니라 진보 보수를 망라한 도덕성 붕괴와 직업윤리 위반은 일상화됐다.
강의 때마다 학생들에게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2017년 8월)을 소개한다. 자본이 어떻게 언론을 길들였는지 보여주는데 이보다 생생한 사례는 없다. 기자들이 삼성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볼썽사납다. 삼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충성 맹세부터 혈맹까지 한참 정도를 넘어섰다. 또 왕조시대를 떠올리는 극존칭과 개인 청탁까지 서슴지 않는다. 문자 청탁 역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자본권력 앞에 바짝 엎드렸다.
자본권력을 향해 꽃노래를 부르는 언론에게 균형 잡힌 견제와 비판을 기대하는 건 순진하다. 김만배 사태에서 거듭 확인됐듯 언론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무디어졌다. 김만배는 기자라기보다는 기자 면허증을 소지한 브로카였다. 스스로도 부족해 자신이 몸담은 언론을 분탕질했다. 붙박이 법조 기자를 하면서 구축한 끈끈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동료 언론인을 떡고물로 후렸다. 낡은 출입처 문화가 낳은 폐해다. 관행적인 출입처 문화를 손볼 때다.
한겨레는 사과문을 내고 편집국장은 사퇴했다. 또 연루된 기자를 해고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신속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진보언론이라는 자기 최면에 매몰된 나머지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수는 악’이라는 극단적 편향에 사로잡힌 나머지 헛발질하기도 했다. <“윤석열도 별장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대표적이다.(2019년 10월 11일 1면 머리기사) 자신들을 문재인 정부와 동일시한 채 팩트 확인조차 게을리한 결과 보도참사로 이어졌다. 7개월 뒤 정정 보도를 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내상을 입었다. 진보정부와 불편한 윤석열 총장을 흠집 내려는 사명감에서 시작했기에 보수정부에서 채동욱 총장을 공격했던 조선일보 행태와 다르지 않았다.
오죽하면 일선 기자들이 집단으로 편향보도를 문제 삼았을까 싶다. 2019년 9월 6일 취재기자 31명은 사내 메일과 대자보를 통해 “조국 후보자 관련 한겨레 보도는 참사”라며 편집국장을 비롯한 국장단 사퇴와 인사검증 소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몇 달 뒤 취재기자 41명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 편들기, 조국 사태 검증 비판 기능 무력화를 거듭 성토했다.(2021년 1월 26일) 이번 김만배 사태에 한겨레 기자가 깊숙이 연루된 건 균형감을 상실한 채 진영논리에 동원된 진보언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지 모른다.
기자(記者)는 판사(判事),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 의사(醫師), 목사(牧師)와 달리 유일하게 ‘놈자(者)’를 쓴다. 곰곰이 생각하면 숨은 뜻을 헤아릴 수 있다.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삿된 글을 ‘쓰는 놈’이 된다는 뜻이다. 존중받는 ‘기록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쓰는 놈’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비록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돌릴 순 없어도 ‘기레기’는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정도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언론 동료들에게는 송구하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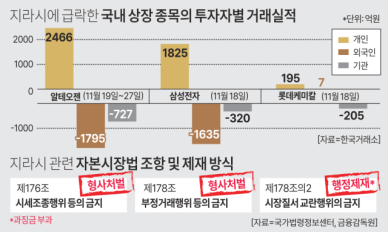
![[2024 스마트대한민국대상]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디지털 전환은 곧 생존과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00558328826_388_136.jpg)
![[단독] 저축은행 사태 투입한 공적자금···정리도, 회수도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34144932955_388_136.jpg)

![[포토] 올해 마지막 금통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8/20241128093240100440_518_323.jpg)
![[포토] 눈 쌓인 덕수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082949997862_518_323.jpg)
![[포토] 화성시 화재현장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123450357646_518_323.jpg)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522913661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