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예산·인력은 줄이고 힘든일만 맡기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예산과 인력 축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배정되는 예산은 6689억원이다. 이는 현행(8171억원) 대비 약 1482억원(약 18%) 가량 적어진다. 정원도 현재 907명에서 746명으로 17.8%줄어든다. 질병관리본부내 일부 조직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겨 오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복지부 측 설명이지만 조직의 격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로 보기에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분리되면서 질병관리청과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조직의 특성상 별개의 조직이 되면 의사결정이나 협업이 원활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보건정책 전문가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하려면 현장대응을 하는 질병관리청의 데이터가 연구원으로 전달되고 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등 협조가 쉬워야 되는데 앞으로는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상으로는 ‘독립’,실제는 관리·감독 강화
청으로 승격시키며 독립적인 인사 및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지만 이것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청 단위의 정부조직은 부처급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을 전담하는 제 2차관을 신설했다. 보건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놓지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겉으로는 독립기관이지만 사실상 복지부의 질본에 대한 통제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된다 하더라도 복지부 산하기 때문에 지휘·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고위직들의 자리와 퇴임 후 갈 곳만 마련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의 핵심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복지부가 챙겨갔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의 장으로 복지부 퇴임 고위직들의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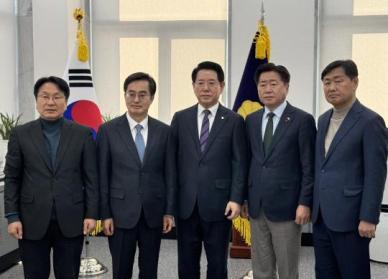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에 모인 5000여명의 성난 시민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48480510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32760229_518_323.jpg)
![[포토]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단체... 윤석열은 퇴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642960301_518_323.jpg)
![[포토] 비상 계엄 사태 여파에 코스피, 1.97% 급락 출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09225679734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