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장들은 ‘여의도 입성’을 위해 공식 임기를 1년이나 남겨놓고 옷을 벗거나 공직 사퇴 시한에 바짝 맞춰 느닷없이 그만두면서 눈총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전 사장은 전북 남원·순창·임실에서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물러났고,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사장은 청주 상당구에 도전장을 내고 지난 2일 퇴임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전 이사장도 지난 7일 물러난 후 1주일 뒤 전북 전주병 출마를 선언했다.
전북 전주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의 경우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다 결국 지난 14일에서야 퇴임했다.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 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이사장,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 전 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등도 이달 중순에서야 줄사표를 내고 중도 하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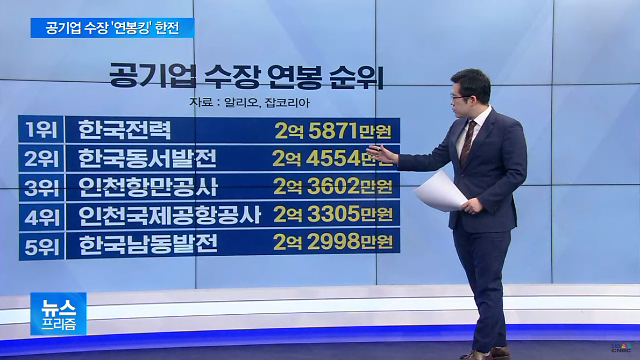
[사진=인터넷]
◇총선 ‘낙선’ 與인사들 위해 자리 비워두나? 靑 ‘늑장 인선’ 의혹도
가장 큰 문제는 수장이 없는 공공기관이 수두룩한데도 인선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새로 선임해야 하는 곳이 10곳을 넘는데다 임기가 지났는데도 후임자 선임이 안 돼 3년 이상 기존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곳이 많다. 일례로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인데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차기 기관장 공모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수자원공사 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고용정보원장 등 5곳 미만이다.
통상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새로 CEO를 선임하기까지 한두 달 이상 절차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달여의 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여권 인사들을 위해 청와대가 자리를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돌려막기식' 낙하산 인사가 대물림되는 셈이다.
역대 정권마다 ‘낙하산’ 논란을 불러 온 공공기관장 자리는 대선 승리에 기여한 선거캠프 인사, 대통령 측근들을 위한 ‘보은’ 인사용이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대략 150여 곳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감사나 임원 등까지 합치면 대략 2000여 개 자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청와대의 입김이 절대적이다.
문재인정부도 출범 후 낙하산 근절을 표방했지만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리품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줄었다고 하지만 낙하산 인사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기관장이 아닌 감사와 고위직 임원으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들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공공기관 임원, 무책임한 사퇴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장치 필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와 공공기관 수장의 무책임한 사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수장 또는 임원직에 있던 인사는 임기 만료 시 일정기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거나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실‧보은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임원추천위원회 대신 공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토] 경찰 출석하는 박종준 경호처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0/20250110101347772711_518_323.jpg)
![[포토]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9/20250109104729509983_518_323.jpg)
![[포토]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002008900920_518_323.jpg)
![[포토] 눈 내리는 제주항공 사고 현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7/20250107105645774286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