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원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국제회의 유치 등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지만, 외형만 성장한 국내 마이스 산업은 터널 안에 갇힌 모습”이라며 “국내 전시 주최자가 CES와 MWC 같은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 해외에 진출하고, (볼륨 커진 상태로) 다시 한국에서 개최해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주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산업 구조도 문제다. 특히, 국제회의 유치사업은 정부 주도로 프로젝트가 추진돼 관련 업체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금만 받으면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국제행사기획사(PCO)는 전시 주최자와 중장기적으로 사업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행사준비 서비스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윤승현 한남대 컨벤션호텔경영학과 교수 겸 한국무역전시학회장은 “글로벌 PCO들은 주최자가 개최하는 행사를 전담하면서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나아가 주최자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에 반해 국내 PCO들은 장기적 파트너십에 공들이기보다 지역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운영하는 데 급급하다”며 “기업은 시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데, 국내 PCO 업체들은 정부가 빨리 행사를 내놓기를 바라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MICE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독일은 10만㎡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10개나 보유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각각 6개의 대형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10만㎡ 이상의 대형 컨벤션센터는 킨텍스가 유일하다.
결국, 마이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시각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마이스 산업의 가치는 행사 참가자의 소비로 측정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외래 방문객 유치를 넘어 도시혁신성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창현 전시컨벤션경영연구소장은 “이제는 ‘컨벤션 레거시(유산)’를 생각해야 한다. 쉽게 말해,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콘퍼런스를 국내에 유치한다면 정부는 이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기업의 목적, 트렌드를 파악해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소가 설립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마이스산업의 가치는 저평가돼 있다. 모든 컨벤션이 도시혁신성장과 연결될 수는 없지만, 컨벤션 자체에 대한 효과 측정 지표를 개발해 향후 마이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효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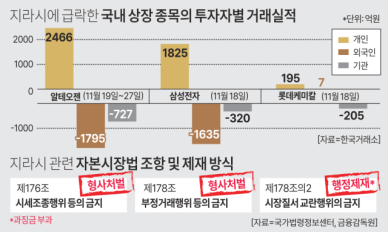
![[2024 스마트대한민국대상]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디지털 전환은 곧 생존과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00558328826_388_136.jpg)
![[단독] 저축은행 사태 투입한 공적자금···정리도, 회수도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34144932955_388_136.jpg)

![[포토]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로 0.25%p 인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8/20241128103857123755_518_323.jpg)
![[포토] 눈 쌓인 덕수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082949997862_518_323.jpg)
![[포토] 화성시 화재현장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123450357646_518_323.jpg)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522913661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