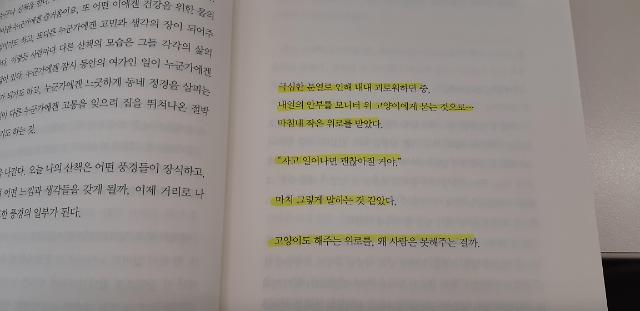
[사진=홍성환 기자]
#극심한 분열로 인해 내내 괴로워하던 중, 내일의 안부를 모니터 위에 고양이에게 묻는 것으로 마침내 작은 위로를 받았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고양이도 해주는 위로를, 왜 사람은 못해주는 걸까. <보통의 존재, 49쪽> (이석원, 달)
공황장애를 앓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나 답답한 공간에 있을 경우 불안해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러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처음 증상을 느꼈을 당시 지하철에서 쓰러졌던 기억 탓에 지하철을 타지 못했습니다. 또 기절할까 봐 겁이 났던 것이죠. 때문에 지하철로 3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로 1시간 넘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버스조차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불안함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픈 것을 꽁꽁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질 않았고 오히려 증상만 심해졌습니다. 뒤에서 혼자 몰래 아파하면서 병을 더욱 악화시킨 셈입니다. 그럴수록 약에 더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 친구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괜찮아”라는 한마디의 위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은 보통의 존재로 바라봐 주는 시선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아픈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그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지네요.


![[2024 서민금융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서민금융 위한 포괄적 선택지 모색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33047477780_388_136.jpg)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518_323.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518_323.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518_323.jpg)
![[슬라이드 포토] 제44회 황금촬영상 시상식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8/20241118194949259743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