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관련기사와 관계 없음.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과 일자리, 내수시장 확대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푸드트럭이 2년간 100여대에 그치며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책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푸드트럭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는 2014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푸드트럭은 100여대 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푸드트럭 운영은 쉽지 않았다. 트럭 개조에 대한 규제만 풀어졌을 뿐 오히려 영업장소나 허가 등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창업을 하려해도 업종이 제한됐거나, 푸드트럭 공모도 1~2대에 불과한 자치단체가 허다했다.
지난해 3월 전국 첫 1호 푸드트럭이 충북에서 문 닫은 것도 정부의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9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허가된 푸드트럭은 모두 109대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푸드트럭 정책발표때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지목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정부가 목표로 한 푸드트럭 규모는 2000대 이상, 6000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현재 운영되는 수치만 볼 때 정부 목표치 대비 5%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호흡을 맞춰야 할 지자체와 엇박자도 목표달성이 어려운 이유다. 대부분 지자체의 푸드트럭 허용 조건에 따르면 법이 정한 허용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관광객이 많은 유원지나 행사장 주변 등 수익이 많은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푸드트럭은 골목상권에도 외면당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며 폐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푸드트럭 창업자는 “노점상 조차도 유동인구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는데 푸드트럭은 그럴 수 없다”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 길거리 상점과 노점 상인들 눈치를 보느라 사업자 모집과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생계형 사업자들은 아예 푸드트럭 사업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 지자체가 정한 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서 푸드트럭이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8곳에 불과하다. 경북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포항과 경주는 아예 허가된 차량이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데다, 제도 개선에만 집중한 나머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며 정부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 하는 것은 좋지만 대책만 내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지자체는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수습하는데도 버겁다. 정부 눈치만 보고 시행했지만 성과가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상권이 형성된 곳에 푸드트럭이 입점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동성과 소자본 창업이라는 잇점을 살려야 한다”며 “정부에서 정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푸드트럭은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과 같다. 이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번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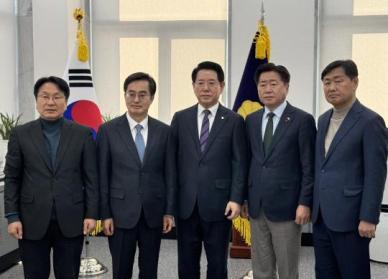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에 모인 5000여명의 성난 시민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48480510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32760229_518_323.jpg)
![[포토]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단체... 윤석열은 퇴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642960301_518_323.jpg)
![[포토] 비상 계엄 사태 여파에 코스피, 1.97% 급락 출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09225679734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