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14일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학교 동문으로 측근인사로 분류돼왔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곧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이날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67년 우리은행 신입행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해 지난 40여년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에서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 금융기관의 말단행원에서 시작해 그룹회장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그러나 이 회장이 이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면서 이른바 금융권 ‘4대 천황’ 중에서는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만 남게 됐다. MB측근 인사를 가리키는 4대 천황은 이들을 비롯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을 일컫는 말이다.
이 회장을 둘러싼 퇴진 압박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계속됐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기관의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는 질문에 “필요하면 교체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강만수 전 산은지주 회장이 물러났다.
이어 신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회장의 거취와 대해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본다”면서 사실상 조기 퇴진을 요구했다. “우리금융 회장은 정부의 민영화 의지와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맡는 게 좋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외부에서 퇴진에 대한 압박이 점차 거세지면서 이제는 거취를 결정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말께 발표를 앞둔 감사원의 우리금융 감사 결과도 이 회장의 사임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임기 내 우리금융 민영화를 성공하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회장 취임 이후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정부지분 17%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에 걸쳐 완전 민영화를 최초로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금융 민영화가 조기에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물러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우리금융은 투입된 공적자금만 약 12조7000억원으로, 현재 약 5조5000억원이 회수된 상태다.
신제윤 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우리금융 민영화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번 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회장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회추위는 사외이사 3명과 주주대표 1명,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회추위에서 선정된 최종 후보가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차기 회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최대 60일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정도에 차기 회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우리금융 회장 후보에는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전광우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깜짝 인사 스타일상 후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 회장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회장 내정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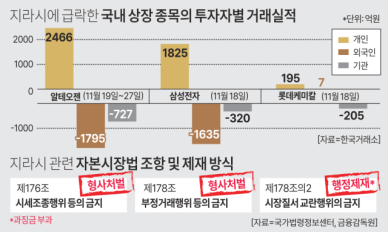
![[2024 스마트대한민국대상]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디지털 전환은 곧 생존과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00558328826_388_136.jpg)
![[단독] 저축은행 사태 투입한 공적자금···정리도, 회수도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34144932955_388_136.jpg)

![[포토]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로 0.25%p 인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8/20241128103857123755_518_323.jpg)
![[포토] 눈 쌓인 덕수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082949997862_518_323.jpg)
![[포토] 화성시 화재현장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123450357646_518_323.jpg)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522913661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