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저는 여자지만 현장 근무를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현장 환경 여건이 더 열악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녹지가 조성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술자로서 누려볼 수 있는 최고의 뿌듯함이었습니다. 휴일도 없이 근무했지만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현장 모습에 힘들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첫 '여성 처장'으로 발탁된 김선미 주택디자인처장은 여성이 아니라 기술자로서의 열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건설업계에 여성이 입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더욱 김 처장은 4살배기 아이를 둔 기혼이었다. 주택 200만호와 이에 따른 대규모 건설인력 채용이 기혼이었던 김 처장에게도 행운(?)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 걸어 왔던 길 중에서 성남 분당신도시 사업과 인공하천 조성공사였던 부천상동지구 ‘시민의 강’ 공사가 가장 애착이 간다고 밝혔다.
그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 동안 감독으로 분당신도시 건설에 참여했다. 이후 승진하면서 3년 정도 본사 근무를 한 뒤에 다시 부천 상동 '시민의 강' 조성 사업 현장에 뛰어 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경험을 다하면서 "기술자로서 성장 할 수 있었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단순 감독 역할에서 한 발 더 나가 '소장’이라는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책임감이 더 많았다. 그래서 부담감이 훨씬 컸지만 그만큼 일에 대한 성취감도 더 컸던 것 같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이처럼 열심히 일해 왔던 김 처장도 유리천장을 느껴봤을까.
"지금까지 수월하게 온 편이긴 하지만 느껴봤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현장근무를 선호했다"는 것이 그의 답이다.
"근무를 하다보면 해외 출장이나 연수 등 직장인에게는 갖기 힘든 기회가 오는데 회사에서 '남자들은 가장이다'라며 이 같은 혜택을 남성위주로 몰아 줬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로써 평가받고 싶은 마음에 현장을 더 지원했다"며 "그러면서도 같이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것보다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현장은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내면 되는데 조직에 있다보면 원치 않아도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 받을 때가 있다는 점이 싫었다"고 말했다.
그런 그도 오늘의 자리에 오기까지 주위의 동료, 특히 선배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타 업계에 비해 보수적이긴 하지만 제가 모셨던 상사들은 저를 많이 인정해주셨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분들 덕택이었죠. 열심히 하는 것을 잘 봐주시고, 승진이나 인사 기회가 있을 때 공정하게 평가를 내려주신 분들을 만났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봐요.”
김 처장은 여성할당제 덕도 봤다고 덧붙였다. 1996년에 기술사를 취득한 후 여성할당제가 생기면서 기술심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자격증 취득이 생각보다 저에게 큰 기회를 줬어요. 기술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니까 바깥에서도 절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하고나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할당’이 생겼고 이후 2000년대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기술심의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갖고 있던 자격이 시기적으로 딱 맞았다”며 본인을 알릴 수 있던 시간들이 됐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이처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던 것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가정교육의 힘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할머니께서는 절대 ‘자싯물 그릇(설거지 그릇)에 손 담그고 살지 말라’고 하셨다”며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손녀딸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셨다고 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져서인지는 몰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컸다”고 말했다.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분명히 내가 붙었으면 다른 사람이 떨어졌을 수 있거든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 대신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일하려고 생각한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일을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일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에 대한 아쉬운 점도 털어놓았다.
그는 여자 후배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큰 문제가 ‘육아문제’라며 여자가 일을 하려면 다른 한 여자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은 후배들이 많이 휴직을 하지만, 1년씩 휴직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 남자들은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준다는 것은 결국 육아에 대한 책임은 곧 여자가 지라는 말이잖아요. 저도 딸이 둘 있어요. 애들이 직장을 다닐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사회 곳곳에서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김 처장은 "사교육비나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이라며 "육아 문제에 대해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날씨] 체감온도 뚝…수도권·중부지방 계속 폭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73110186226_388_136.jpg)
![[뉴 삼성 신호탄] 베테랑 선배가 나서 경쟁력 회복하라··· 어깨 무거워진 부회장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45054828631_388_1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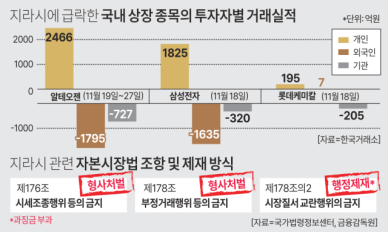
![[2024 스마트대한민국대상]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디지털 전환은 곧 생존과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00558328826_388_136.jpg)
![[단독] 저축은행 사태 투입한 공적자금···정리도, 회수도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34144932955_388_136.jpg)

![[포토] 눈 쌓인 덕수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082949997862_518_323.jpg)
![[포토] 화성시 화재현장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123450357646_518_323.jpg)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5229136612_518_323.jpg)
![[포토]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060998561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