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지난 2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아리셀 공장의 위험물 저장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8/20240628152939964007.jpg)
경찰이 경기 화성 1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과 사상자만 31명이라는 큰 인명피해로 번진 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화성 화재가 '인재(人災)'가 아니냐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아리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리튬 배터리 제조 공정과 안전 분야에 관한 서류, 전자 정보 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건물 평면도에는 최초 발화 지점 주변에 벽면이 세워져 공간 분리가 된 상태다. 그런데 리튬 배터리를 쌓아둔 곳에서 불이 시작되는 화재 당시 CCTV를 보면 평면도에 있던 벽은 없고, 모든 공간이 개방돼 있다. 이 벽은 내력벽(하중을 지탱해 구조물 기초로 전달하는 벽)이 아닌 가벽으로 파악됐다.
아리셀이 가벽을 철거하면서 아무런 신고나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방당국의 진화·수색 작업에 혼선을 줬을 여지가 있어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당초 설계대로 가벽이 있었다면 연기 확산을 막아 인명피해를 다소 줄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가벽으로 유독가스를 완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가벽의 존재 여부가 대규모 인명피해와 연관이 있는지는 좀 더 수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리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장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위험물인데, 아리셀이 이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재 CCTV 영상에는 작업장 내 리튬 배터리를 쌓아 놓은 곳에서 처음으로 불꽃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불은 한 배터리에서 또 다른 배터리로 번져나가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리튬과 같은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작업장 내에는 필요한 양만 둬야 한다.
아리셀이 리튬 배터리를 보관할 저장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작업장과 구분을 두지 않은 채 작업을 이어온 것이 사실이면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위험물질의 양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어서 또 다른 관련 규정을 확인해 봐야 불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작업장에 쌓아뒀던 리튬 배터리가 보관 과정에서 외부 충격 등에 잘 견딜 수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터리는 사각형 플라스틱 트레이에 64개씩 각 구획된 공간에 꽂아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에 외부 충격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지난 26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의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8/20240628153544798559.jpg)
경찰은 아리셀이 방화문과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적법하게 갖췄는지,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화재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화재 발생 3개월 전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고, 19일 전에는 화재안전컨설팅이 있었던 점, 불과 2일 전에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던 점 등 사고 예방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아리셀의 대처에 불법 사항은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인과관계가 누적된 '총체적 부실'에 의한 참사로 보고, 사고를 전후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것"이라며 "'화재 원인 규명'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원인 규명' 외에 불법 파견 등의 의혹은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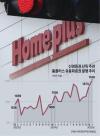
![[날씨] 매서운 꽃샘추위 계속…전국 곳곳에 눈·비 예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174639363851_388_136.jpg)
![[포토] 광화문 비상행동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170659258910_518_323.jpg)
![[포토] 유튜버 이진호 고소장 제출하는 김새론 유족 측 변호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170350294094_518_323.jpg)
![[포토] 봄에 펼쳐진 겨울 풍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120920490642_518_323.jpg)
![[슬라이드 포토] 故 휘성, 영정 사진 속 환한 미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131052257994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