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김수지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02/20240602104928783570.jpg)
최근 은행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배상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를 맞은 손실 확정 계좌 6300여 건을 대상으로 협의를 시작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다수 고객과 자율배상을 위한 조정을 시작해 배상을 받는 이들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은행들이 ELS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담코자 일제히 자율배상을 결정한 결과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자율배상 협의가 속속 이뤄지고 있음에도 ‘ELS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금융당국이 이번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불거진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미 당국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 방안을 추리고 있다. 여기엔 은행들 의견도 전달됐다.
문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자율성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던 은행권을 다시금 옥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최종안이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정된다면 은행이 사업을 다각화하는 길도 막힐 수 있다. 최근 들어 예·적금 등 전통적인 금융 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비금융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은행권에는 제동이 불가피해진다. ELS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당국은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연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다.
은행권에선 당연히 볼멘소리가 새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ELS를 판매하면서 행원들은 당연히 대부분 정해져 있는 절차를 그대로 준수했는데도 불완전판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에도 적극 나섰는데 상품 판매까지 극도로 제한되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내놓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도 개선 방향이다. 은행권을 옥죄는 게 아닌 홍콩 H지수 ELS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제도를 완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규제만 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본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은행에서 위험도가 있는 상품을 어디까지 취급할 수 있고,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한 만큼 엄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제도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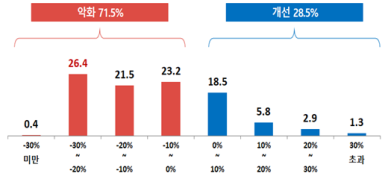



![[날씨] 춘분, 전국 대체로 맑아...중부 내륙 구름 많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9/20250319180441576103_388_136.jpg)
![[포토] 탄핵선고 앞두고 연합훈련 실시한 경찰기동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8/20250318165751631571_518_323.jpg)
![[포토]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 발령한 관세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8/20250318125238953396_518_323.jpg)
![[포토] 광화문 비상행동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170659258910_518_323.jpg)
![[포토] 유튜버 이진호 고소장 제출하는 김새론 유족 측 변호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170350294094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