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정만은 아니다. 자동차산업은 4차 산업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앞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은 하락 추세다.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사지 않기 시작했다. 대안은 공유경제서비스다. 자동차는 이미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차량공유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3548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일찌감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 다임러는 연초 공유서비스 합작법인을 만들어 1조원 규모를 투자했다.
현대차도 시대의 변화를 읽었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시선은 국내보다 해외에 있다. 국내 공유차 시장은 택시업계 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서 여론을 의식해 논란의 중심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공유차 업체 '우버'는 국내에서 사업을 펼치지도 못했고, 국내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는 택시업계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신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도 많다.
그 사이 현대차는 해외 차량 공유·호출서비스 기업에 통 큰 베팅을 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판 우버인 '그랩'에 약 3151억투자를 시작으로 호주 카넥스트도어, 중국 임모터, 인도 레브·올라, 미국 미고 등에 투자했다. 총 투자 금액은 수십 조 단위로 추정된다.
경직된 노동환경, 신산업 진출 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은 매력적이지 않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의 발목이라도 잡아야 할 상황인데 불필요한 논쟁으로 오히려 내쫓는 셈이다.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며 청와대 정책라인 교체, 제조업 르네상스 구상 등 해결책을 내놨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업과 비교하면 너무 느긋하다.
정부가 실력을 발휘해야할 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이다. 지난 후에는 소용없다.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교훈으로 기형적인 국내 시장의 구조를 털고 가야한다. 이해관계자도 마찬가지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투쟁 만능주의'로만 시장경제를 바라보면 글로벌시장에서의 도태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미지 확대

[사진 = 김해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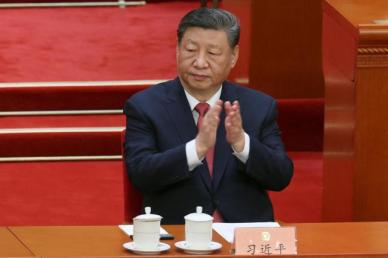

![[포토] 고 김새론 유족 측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163131109279_518_323.jpg)
![[포토] 청송휴게소 할퀴고 간 산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102008427189_518_323.jpg)
![[포토] 이재명 대표, 2심 무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6/20250326160602449127_518_323.jpg)
![[포토] 2025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2025 APFF)](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6/20250326100935654866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