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과 시민들을 중국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한 '톈먼 사태' 당시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1989년 6월, 베이징(北京)은 잔인했다. 톈안먼(천안문·天安門) 광장은 피로 물들었다. 후야오방(胡耀邦) 공산당 총서기를 애도하기 위한 ‘인민’은 자신들을 지켜줘야 할 임무를 지고 있던 ‘인민해방군’에게 짓밟혔다. 민주를 요구한 대가는 혹독했다. 상상조차 못했던 잔혹 드라마는 사망, 상해, 망명, 도피라는 후속편으로 이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영화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걸까? 베이징 한복판에서 친구들이 쓰러져가는 장면을 직접 목도한 베이징영화대학(北京電影學院) 학생들은 괴로웠다. 냉혹하게 얼어붙은 계절, 그들은 영화의 권리와 의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세대’라는 이름으로 유수 영화제를 드나들며 명성을 쌓아온 동문 선배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영화는 적어도 천카이거(陳凱歌)나 장이머우(張藝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야만 했다.

영화 '북경녀석들'을 연출한 장위안 감독. [사진=바이두]
‘6세대’가 탄생했다. 장위안(張元)은 중국영화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데뷔작 ‘엄마(媽媽, 1990)’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와 아들의 삶을 그렸다. 소수자에 대한 휴머니즘으로 무장한 영화는 해외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 장애인은 있을 수 없다는 당국의 판단으로 상영이 금지됐다.
장위안은 더 멀리 가버렸다. 두 번째 영화는 ‘북경녀석들(北京雜種, 1992)’이었다. 영화는 비 내리는 거리, 록 음악이 교차하는 화면으로 시작한다. 다큐멘터리로 기획됐지만, 당국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감독, 거듭되는 촬영의 난항으로 극영화 방식이 결합됐다. 화면 속 베이징 청년들은 불온하다. 비 내리는 밤, 카쯔(卡子)와 여자친구 마오마오(毛毛)는 낙태 문제를 두고 다툰다. 중국 최초의 록 가수 추이젠(崔健)은 연습장을 잃은 뒤 야외 공터에서 격정적으로 노래한다. “내 몸은 꼭 감은 네 두 눈에 기대고 있어. 내 손은 벌써 나 자신을 잡고 있어.”
돈, 섹스, 낙태, 젊음, 노래라는 화두는 ‘황량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고통을 맨살의 상처처럼 노출한다. 도시 속 화두들은 하나같이 불온하기 짝이 없다. 화면은 체제가 인정할 수 없는 불온한 화두를 가득 담아낸다. 록으로 승화된 가사는 정치와 이데올로기 따위에 얽매여 살지 않으리라는 그들의 의지를 드러낸다.

승합차 안에서 천안문 광장을 촬영한 영화 '북경녀석들'의 한 장면.[사진=영화 '북경녀석들' 장면 캡처]
중국영화는 드디어 ‘개인’을 발견한다. 그러나 ‘개인’은 문화대혁명 못지않은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 중국영화는 드디어 ‘오늘’, ‘여기’, ‘우리’의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 그렇게 6세대는 선배 세대와는 다른 영화 문법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영화는 살아남은 자들, 친구들을 광장에 묻고 치욕스럽게 살아남은 청년들의 고뇌이자 고백이다. 우리말로 옮겨진 영화 제목은 자못 순화된 표현이다. ‘녀석들’은 최소한 ‘개자식’으로 번역돼야 옳았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독한 혐오의 단어. ‘북경’은 당국의 심사 기준에 따라 영화 제목에는 아예 쓸 수 없는 금지어였다. 그로 인해 연상하게 될 동시대에 대한 지독한 비관의 직설이라고 할 수 있다. 혹시 ‘북경 자전거’라는 영화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열일곱 살의 자전거’라는 원제의 우리말 번역일 뿐이다.
영화는 죄다 금지된 것들에 대한 도전이었다. 톈안먼 광장을 찍어 영화에 담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금지에 도전한 영화는 승합차 안에서 비 내리는 차창 밖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톈안먼을 가져온다. 그 장면만으로도 영화는 도전과 저항의 상징이 됐다. 그러니 심미적 수준만 문제 삼는다면 영화는 별 볼 일 없다. 카메라는 흔들리기 일쑤였고 조명은 형편없었다. 그러나 동시대 집단의 고통에 대한 개인의 고뇌와 방황을 문제 삼는다면 영화는 그 의미가 심장하다.
‘북경녀석들’ 이후 중국 독립영화를 말할 때, 그 ‘독립’은 자본과의 결별만을 뜻하지 않게 됐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중국의 독립영화는 지하영화와 동의어가 될 수 있었다. 6세대는 독립하기 위해 지하로 걸어 들어갔고, 거기에서 지독한 사실주의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감독 장위안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광장(廣場, 1995)’과 ‘아들(兒子, 1995)’로 이어진 후속작은 여전히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동궁서궁(東宮西宮, 1999)’은 소재주의에 함몰됐고 ‘크레이지 잉글리시(瘋狂英語, 1999)’, ‘귀성(過年回家, 1999)’은 저항했던 대상에게 온화한 태도로 ‘투항’해 버린 듯 힘을 잃고 말았다.
동세대 다른 감독이 뒤따랐다. 사실주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에게 다큐멘터리 또는 그런 기법은 훌륭한 장르였고, 형식미학에서 놓여난 새로운 예술적 추구가 이어졌다. 그 중심에 지아장커(賈樟柯)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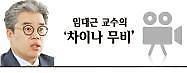
[임대근 교수의 차이나 무비]








![[성낙인의 헌법정치] 12.3 서울의 밤 법치 경계를 허물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6/20241226050208821482_388_136.jpg)
![[포토] 윤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오늘은 기다려볼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5/20241225120851969194_518_323.jpg)
![[포토] 어지러운 세상, 잠시만 잊고 메리크리스마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4/20241224205253484194_518_323.jpg)
![[포토] 2025 아주경제 미래 전망 총장 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3/20241223204826600972_518_323.jpg)
![[슬라이드 포토] 2024 SBS 연기대상 레드카펫을 빛낸 배우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1/20241221223535311348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