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이 시작되면서 교통사고 처리를 놓고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물론 소프트웨어 업체, 통신사 등 여러 회사가 자율주행차 제작·운영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24일 지자체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성남시 판교에 선보일 국내 최초 자율주행 버스인 '제로셔틀' 시범운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달 중 임시 주행허가를 얻고 다음 달부터 주행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다면 설 연휴 전후로 번호판을 받아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주행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차량 외부 센서나 통신 등을 활용해 도로 상황을 파악, 자동차 스스로 핸들이나 브레이크·가속 페달 등을 제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시범주행이 가능해졌다.
시범운영이 논의될 만큼 자율주행차 기술이 가파르게 발전하면서 보험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에서 사고가 날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이 시험용 자율주행 자동차보험 상품을 특약 형태로 출시했다. 이들 상품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기존 자동차보험처럼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고 있다. 시험용 기술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다만 자율주행차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된 이후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시스템 오류나 장비 탓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피해보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대신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을 갖게 되는 보험사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는 완성차 업체와 소프트웨어(시스템) 제조사, 통신사 등 여러 업체의 협력으로 만들어진다. 이 중 누구에게 결함의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서두르지는 않은 기색이다. 지난해 말 정부 및 60여개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등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다뤄졌으나 논의가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운전자 및 이를 대변하는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을 것 같다"며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된다면 조만간 보험이 없어 자율주행차가 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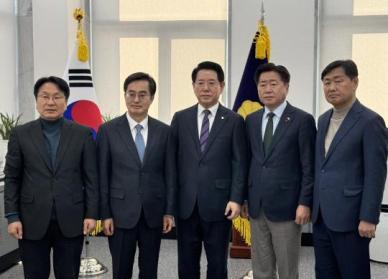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하며 행진하는 참석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201639295254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에 모인 5000여명의 성난 시민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48480510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32760229_518_323.jpg)
![[포토]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단체... 윤석열은 퇴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64296030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