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에 따라, 조만간 대형마트와 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은 롯데몰 은평점 조감도. [사진=롯데몰 홈페이지]
김온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 규제의 범위를 넗히고 있다.
18일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명분은 골목상권 보호다. 대기업의 지나친 영업 확장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의 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대기업 A유통사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은 시장 흐름에 따른 변화로, 마냥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최신식·현대적인 쇼핑 문화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 소비를 이끌어내려면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서울 등 6대 광역시 1000여개 소매유통업체 대상 2017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 따르면 전망지수는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하는 91에 그쳤다. RBSI는 유통업체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인데, 100 이상일 경우 호전을 예상하는 경우이며, 반대의 경우 악화 예상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조사 결과, 전통 시장당 하루 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겨우 1.19% 상승하는 데 그쳤다.
B유통사 관계자 역시 "소비자들에게 대형마트는 그때그때 필요한 필수품을 구매하는 장소라기보다 '몰링'을 즐기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업계도 그에 맞게 쇼핑몰을 변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단순히 쇼핑몰 매장 운영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도 불편할 뿐 아니라, 대기업이 전통시장과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부언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이미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일례로 이마트가 신선식품 판매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통시장 내에 상생스토어를 개장하고 있으며, 롯데몰은 일부 전통 시장에 대해 낙후된 설비를 보수해주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으로 고객이 갈 것이라는 일원론적인 생각으로는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시장 논리에 맞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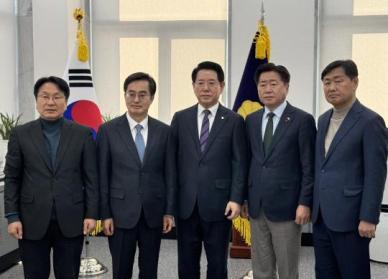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하며 행진하는 참석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201639295254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에 모인 5000여명의 성난 시민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48480510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32760229_518_323.jpg)
![[포토]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단체... 윤석열은 퇴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64296030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