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 차일혁기념사업회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7/09/20170709153945935112.jpg)
[사진: 차일혁기념사업회 제공]
그러니 묻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는 그런 차일혁 대장과 경찰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곤 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술회(述懷)했다. “차일혁 대장 아니 대한민국 경찰의 아량이 그 어느 때보다 무척 빛나 보였다”고 김만석은 자신의 비망록에 글을 남겼다.
차일혁의 그런 행보는 첫 전투인 구이면 전투부터 시작됐다. 구이면 전투가 끝난 후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은 경찰 전사자 4명의 시신과 부상자들을 모아놓고, 그 앞쪽으로 빨치산들의 시체와 부상자 및 생포자들을 앉혔다. 현장에 쓰러져 있는 대원들의 시체와 빨치산들의 시체를 바라볼 때 차일혁은 너무나 처참한 광경에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며 눈이 절로 감겨 왔다. 차일혁은 눈을 감은 채 잠시 동안 마음속으로 세상을 버린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차일혁은 잠시 상념에 잠겼다.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빨치산들과 아무리 원수처럼 싸웠다고 할지라도 조상(祖上)을 같이 하여 이 하늘 아래에서 태어나 같은 대지 위에서 자란 피부와 언어가 같은 동포 아닌가? 젊은 몸뚱이를 악의 구덩이에 잘못 던져 오늘의 이 처참한 최후를 가져왔음이 자업자득의 죄과(罪科)라 할지라도 이렇게 붉은 피 흘리고 흰 눈에 쓰러진 젊은 육신들을 볼 때 얄궂은 민족적 비운을 다시금 뼈아프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1951년 4월 중순, 정읍작전 중 차일혁은 밤낮없이 계속된 사흘간의 전투 후 잠시 휴식을 틈타 참호 안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차일혁은 그동안 쌓인 피로로 인해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갑자기 천둥치는 큰 소리에 잠을 깨고 보니 차일혁 자신은 천정에서 무너진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간신히 흙을 헤치고 참호 밖으로 나와 보니 빨치산시체 1구가 놓여 있었다.
이미지 확대
![[사진: 차일혁기념사업회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7/09/20170709154023450576.jpg)
[사진: 차일혁기념사업회 제공]
그렇지만 차일혁이 상대했던 빨치산들은 달랐다. 빨치산들은 경찰들의 시체를 발견하면, 대부분 옷을 벗기고 시신을 훼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된 경찰들의 시신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대부분의 경찰들 시신은 빨치산에 의해 난자당한 채로 산중에 버려졌다. 빨치산들은 경찰들의 시신에 대해서는 온갖 만행을 가하면서도 자기편의 시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꼭 챙겨서 달아났다.
빨치산들은 자신들이 경찰들의 시신을 훼손하기 때문인지, 그들의 동료가 죽으면 가급적 끌고 가서 묻어버리려고 노력했다. 경찰에게 자신들의 동료인 빨치산의 시체가 유린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차일혁은 빨치산들의 그런 형태를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의리’라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과 경찰의 전과(戰果)를 방해하려는 전술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차일혁은 빨치산의 그런 행동을 보고 비록 적이지만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했다.
차일혁이 빨치산 시신 중 마지막으로 처리해 준 것은 빨치산 총수였던 이현상(李鉉相)이었다. 1953년 10월 8일. 차일혁은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제2연대 본부 옆에 있는 섬진강 백사장에서 이현상의 시신을 화장해 줬다. 총탄을 무수히 맞아 만신창이가 된 이현상의 몸 위에 차일혁은 그의 유품인 염주를 올려놓으며 명복을 빌어줬다. 차일혁은 첫 전투에서부터 마지막 전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이루고 얻었지만, 그중에서도 차일혁 자신이 했던 일 중 인간적으로 가장 뿌듯하게 여겼던 것은 적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었던, ‘빨치산 시신’에 대한 매장이 아니었을까 싶다.
차일혁은 비록 전투에서는 처절하게 싸웠지만, 죽은 빨치산의 시체에 대해서까지 인간 태초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 관대하게 처리했다. 그런 점에서 차일혁은 적에 대해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만을 가진 용맹스런 무장(武將)뿐만 아니라, 인정과 사랑과 눈물을 아울러 가진 ‘휴머니스트 지휘관’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인지 차일혁이 토벌작전을 했던 전라북도와 지리산 지역에서 차일혁에 대한 ‘원성’은 여태껏 단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차일혁에 대한 인간적인 명성과 흠모만이 세인(世人)들의 가슴을 흠뻑 적셔주고 있을 뿐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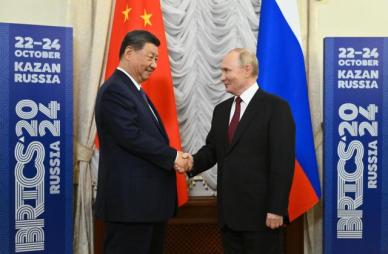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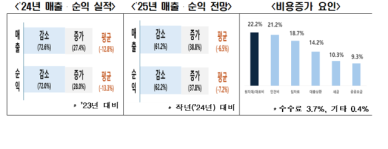

![[포토]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105538654937_518_323.jpg)
![[포토]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3.00→2.7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105904720186_518_323.jpg)
![[포토] 배우 김새론 발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21051906909_518_323.jpg)
![[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21 첫 시험비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5144535701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