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이정수 생활경제부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의과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 의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약사들에게 신약 등재심사 관련정보를 알려주고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제약사들이 해당 의사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지원 명목으로 총 4억원을 제공한 사실도 포착됐다.
따지고 보면 제약사들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건만, 시기적으로 이번 소식이 주는 아쉬움은 적잖다.
의약품은 근본적으로 상품이지만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성격까지 갖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개발,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신약개발이 최근 제약업계의 주요 생존전략이자,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제약사간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제약사들이 이에 대한 성과로 자체 신약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를 자부하기에 앞서서 제약사 스스로가 떳떳할 수 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불법리베이트와 뇌물 같은 부정부패가 남아있는 한 신약개발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제약업계의 노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원희목 회장에 앞서 7년여에 가깝도록 제약업계에 헌신해온 이경호 전 한국제약협회장은 지난달 말 물러나는 자리에서까지도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그간 제약업계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무엇보다도 강조해왔던 이 회장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리경영 정착’이라는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도 사회적으로 윤리경영을 바라보는 척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약사들의 신약개발과 공공적 기능은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밑바탕에 갖춰져야 비로소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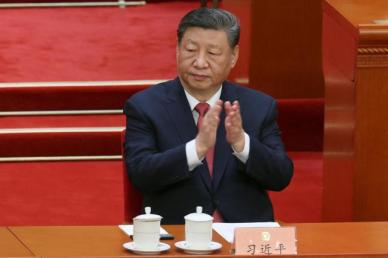

![[포토] 고 김새론 유족 측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163131109279_518_323.jpg)
![[포토] 청송휴게소 할퀴고 간 산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102008427189_518_323.jpg)
![[포토] 이재명 대표, 2심 무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6/20250326160602449127_518_323.jpg)
![[포토] 2025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2025 APFF)](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6/20250326100935654866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