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세수부진의 영향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는데 여러 가지 변수로 애초 기대했던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망이 담긴 '2016년도 정부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올해(595조1000억원)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올라간다. 지난해 전망한 35.7%보다 4.4%포인트나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17년 41.0%, 2018년 4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원 적자(GDP 대비 -2.3%)가 나게 된다. 이런 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43조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정부는 2년 전 세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0.4%로 줄여 사실상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적자 비율이 ±0.5% 이내이면 균형 재정 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지난해 계획에선 2017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3%로 수정했고 올해는 -2.0%로 또 뒷걸음질 쳤다.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정부가 올해 경기살리기에 올인한 예산에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경기 살리기에 나섰음에도 뚜렷한 경기개선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 부담을 안고서라도 재정을 확대해 '경제 활성화→세수 증가→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선순환을 위한 첫 단계부터 삐걱댔다.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해 수출이 부진한 데다 메르스 사태로 내수까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40% 초반대 국가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인 114.6%(올해 전망치 기준)와 비교하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국가부채비율 평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3.5%에서 올해 114.6%로 41.1%포인트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28.7%에서 38.5%로 9.8%포인트 늘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OECD 국가들은 지난 7년간 극도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왔다"며 "전 세계가 확장 재정으로 자국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것을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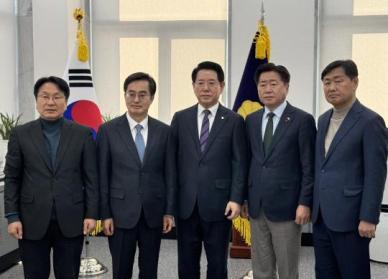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에 모인 5000여명의 성난 시민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48480510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32760229_518_323.jpg)
![[포토]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단체... 윤석열은 퇴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642960301_518_323.jpg)
![[포토] 비상 계엄 사태 여파에 코스피, 1.97% 급락 출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09225679734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