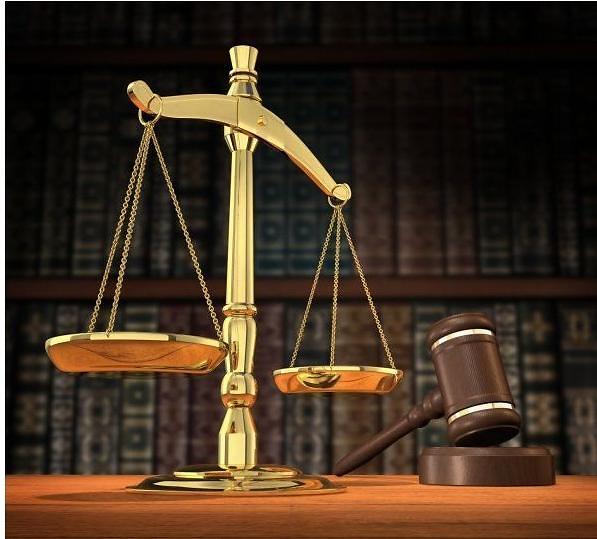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최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원론적 차원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조항만 봐도 선언에 지나지 않는 조항이 많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크다.
실제 헌법 제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만 돼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돼야 할 소득, 교육, 고용, 노동조건, 건강, 환경, 주거 등에 대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들 역시 현 시대상에 맞게 헌법이 고쳐져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지난달 말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 3명 중 2명은 ‘권력구조 외에도 경제 및 사회·인권 사항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5월 동안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로 활동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활동보고서에서 지난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기본권 규정을 체계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생명권, 안전의 권리, 성평등권,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권리보호,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했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이 비단 정부의 형태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헌법의 조문 하나 하나를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시비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도 더욱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국민도 기본권 침해 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지만 적기에 처리되지 못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6년간 연말기준 장기미제 사건은 2009년 35건, 2010년 38건, 2011년 43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년(7월말 현재) 20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처리건수는 2009년 117건, 2010년 71건, 2011년 89건, 2012년 97건, 2013년 98건, 2014년(7월말 현재) 77건 등으로 조사됐다.
헌재가 정치관계법에 대한 일련의 결정에선 인권·민주주의에 대한 존중보다 정치의 논리를 더 우선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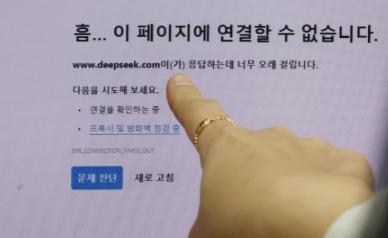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