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테크노마트 상우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을지로 한 이동통신사 본사 앞에서 '단통법 페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각종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선의 대안은 ‘누더기’가 된 단통법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다. 가장 적법하고 구속력이 강하는 점에서다. 하지만 세월호 등 일련의 사태를 비춰봤을 때 현재의 정치권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통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는 얘기다.
개정안 발의 등 국회의 힘을 빌리지 않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두 가지 대안은 모두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애초의 단통법의 취지 역시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해 시장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물론 총대는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메야한다.
첫 번째는 알뜰폰으로 대표되는 저가폰과 중고폰 판매 활성화다. 매년 4월 확정되는 알뜰폰 도매 대가를 낮춰 확실한 메리트를 주는 방법이다. 알뜰폰 자체가 저가요금제를 쓰고 있어 요금 인하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우체국과 더불어 온라인 알뜰폰 유통사이트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14일 한 알뜰폰 관계자는 “미래부가 31개까지 (알뜰폰 업체를) 만들어 놨으면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냐”면서 “대기업 자회사 등 상위 5개 알뜰폰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군소 업체들은 앞으로 답이 없다”고 말했다.

[2014년 이동전화 번호이동자수 현황.jpg]
특히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은 중고폰 판매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파법 개정안은 해외 구매제품에 대해 개인은 전파인증 면제를 유지하지만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 등 구매대행 업체가 해외 단말기를 판매하려면 최대 3300만원의 전파 인증비를 내야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날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전파법이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의사를 시사했다.
현재 중고 휴대전화 하루 평균 가입자가 48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이동통신 3사의 2년 약정 만료자가 25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하지 못할 수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삼성 단말기가 싸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문제”라며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대안은 보조금 적용 범위의 손질이다. 최대 34만5000원까지 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은 9만원대 이상의 고가요금제에 국한돼 있다. 국민들이 속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저가요금제에도 보조금이 일정 부분 이상 받을 수 있게 보조금 지급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지적이다.
요금제 설정 및 구간 변경은 전적으로 미래부와 방통위 권한이므로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박종일 착한텔레콤 대표는 “규제산업이라는 휴대폰 시장의 특성상 통신사와 제조사를 압박해서 보조금을 늘리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사실상 삼성의 독점구조인 제조사에게 출고가 낮추라고 해도 결국 ‘팔목 비틀기’밖에 안 된다”면서 “어차피 출고가는 이통3사와 제조사가 정하는데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해도 이통사가 올려 팔면 할 말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장 단통법 때문에 휴대폰은 안사도 회선 자체를 끊지는 않는다”면서 “이통3사 견제는 알뜰폰, 삼성 견제는 해외랑 경쟁을 붙여 가격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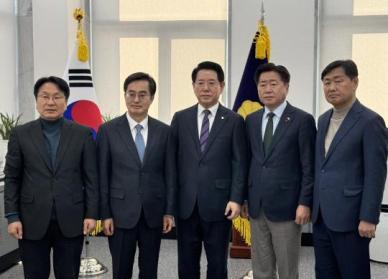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하며 행진하는 참석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201639295254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에 모인 5000여명의 성난 시민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48480510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32760229_518_323.jpg)
![[포토]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단체... 윤석열은 퇴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64296030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