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경수 기자=‘레이업’은 플레이선의 장애물을 피해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아시안·한국프로골프투어 ‘CJ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는 데이비드 톰스(46·미국)는 레이업을 잘 하는 선수다. 샷 거리가 짧은 것이 주된 이유인데,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이 전략이 ‘하이 스코어’를 막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드라이버샷이 러프에 멈췄다. 홀까지 거리는 150야드 이상 되지만 그린을 노려볼만한 상황이다. ‘직접 공략하자’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안전하게 돌아가자’는 마음도 있다. 이 때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볼에서 홀에 이르는 플레이선, 특히 그린 앞에 해저드(벙커·워터해저드)가 있는지 살핀다. 아무런 해저드가 없어 그린이 열려있을 경우 곧바로 그린을 노릴 수 있다. 이 경우 제대로 맞지 않더라도 볼은 그린앞 웨지거리에 멈출 것이므로 다음샷에 파세이브 기회는 있다. 클럽은 페어웨이에서와 같은 것을 고른다. 러프이기 때문에 줄어든 ‘캐리’(떠가는 거리)는 낙하 후 상대적으로 많이 굴러가는 것(런)으로 상쇄되는 까닭이다. 그린앞에 해저드가 가로놓여 있을 경우엔 레이업을 고려하라. 샷이 조금이라도 짧거나 페어웨이에서 칠 때처럼 충분히 뜨지 않으면 해저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홀까지 자신있는 거리에 볼을 갖다놓은뒤 다음샷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현명하다.
◆라이가 좋은가, 나쁜가
러프이지만 볼이 풀잎에 올려져 있어 클럽헤드가 볼밑을 파고들 정도라면 괜찮은 라이다. 이런 경우엔 볼도 뜨고 거리도 페어웨이에서 칠 때만큼 난다. 다만 볼과 클럽사이에 풀이 끼여 스핀이 덜 먹음으로써 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한 클럽 짧게 잡는다. 그 반면 볼을 충분히 띄우기 어려울만큼 라이가 좋지 않다면 레이업을 택하는 것이 ‘빅 넘버’를 막는 길이다. 좋지 않은 라이에서 볼을 띄우려면 풀을 헤쳐나갈만한 파워와 헤드 스피드가 필요하다. 그만한 자신이 없으면 로프트가 큰 클럽으로 볼을 페어웨이로 꺼낸다음 다음샷으로 파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홀이 앞쪽인가, 뒤쪽인가
깃대가 그린 앞쪽에 꽂혀있느냐, 뒤쪽에 꽂혀있느냐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러프에서는 좀처럼 스핀을 먹일 수 없기 때문이다. 홀에 앞에 있으면 레이업, 뒤에 있으면 직접 공략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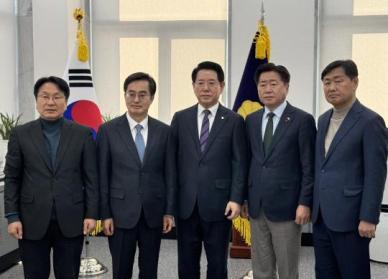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하며 행진하는 참석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201639295254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에 모인 5000여명의 성난 시민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48480510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32760229_518_323.jpg)
![[포토]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단체... 윤석열은 퇴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64296030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