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통해 아직 갚지 못한 8조원의 공적자금을 거둬들여야 하지만, 사측의 강력한 반발에 민영화 논의가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형국이다.
◇ 서울보증 민영화, 사측 강력 반발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 간 계약 등 각종 상거래에 필요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보증보험은 외환위기 당시 극심한 경영난으로 공적자금 12조원을 ‘수혈’받았다.
이는 공적자금 17조원을 지원받은 제일은행을 제외하면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다. 공적자금 지원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이뤄졌다.
서울보증보험은 지금껏 3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지만, 아직 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갚지 못했다.
공적자금 상환은 민영화, 즉 예보가 가지고 있는 서울보증 지분 94%의 매각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지분 매각이 이뤄져야만 막대한 매각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영화 대상인 서울보증보험이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것도 노조가 아닌 경영진이 발벗고 나섰다.
서울보증 김병기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영화 논의는 시기상조다. 수익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기업가치를 높인 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도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분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만 밝혔다.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민영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한 모습이다.
◇ “지금이 민영화 적기..자사 이기주의 버려야”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는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기업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보증이 예보에 대한 우선주 상환을 마치면 보증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우선주 상환은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보증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들어서면 보증시장의 상당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보증의 기업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보증은 경쟁체제 도입마저 반대하고 있지만, 시장 자유화의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서울보증이 ‘서민 금융기관’ 운운하며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12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지만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00년 3천600만원에서 지난해 7천만원 이상으로 두배로 뛰어올랐다. 부장급인 일부 지점장 연봉은 1억3천만원이 넘는다.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이 6천5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들의 임금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민영화 등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자사 이기주의’ 때문 아니겠느냐”며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서라도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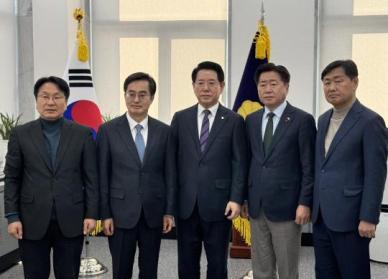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에 모인 5000여명의 성난 시민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48480510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32760229_518_323.jpg)
![[포토]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단체... 윤석열은 퇴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642960301_518_323.jpg)
![[포토] 비상 계엄 사태 여파에 코스피, 1.97% 급락 출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09225679734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