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해 말 신용카드 모집인 수는 총 5만292명으로 1년새 43.7%가 늘었다. 신규카드 발급수도 증가해 한국은행 통계상 총 1억1699억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1월말 기준). 1년 전보다 10.2% 늘어난 수치로, 카드대란이 터지기 직전인 2002년 말의 1억488만장을 훨씬 웃돌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보유 카드 수도 4.59개로 카드대란 전 4.57장을 넘어서 2003년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뒷받침해준다.
2003년 카드대란은 온 국민이 체감한 부정적인 사건 중 하나다. 4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서민경제가 파탄났으며, 카드빚 부담에 자살한 가장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억에 대해 더 기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자기 본능으로 카드대란을 떠올리게 하는 각종 지표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신규 발급된 신용카드의 대부분이 신용등급 7~8등급인 저신용자들에게 쏠려있다는 통계도 나와 우려를 더욱 키운다.
정작 카드사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태연하다. 2003년과 달리 연체율이 잘 관리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언론에서 공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원망섞인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는 격이다. 이미 해당 지표들은 누가봐도 카드 남발과 연체율 증가로 인한 카드대란을 떠올리기에 충분히 닮아 있다. 오히려 이를 간과한 듯한 카드사의 태도에 국민들은 또 다시 불안해진다. 카드대란의 악몽은 한번이면 족하다. 카드사야말로 학습효과로 인한 민첩한 태도 변화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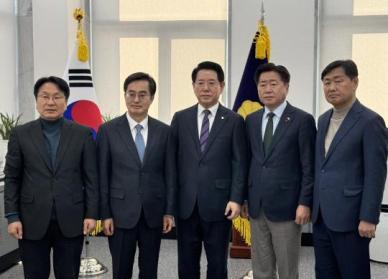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하며 행진하는 참석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201639295254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에 모인 5000여명의 성난 시민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48480510_518_323.jpg)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41232760229_518_323.jpg)
![[포토]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단체... 윤석열은 퇴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64296030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