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회의에서 러몬도 장관은 ‘자발적 설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방물자생산법(DPA) 적용까지 언급했다. DPA는1950년 6·25전쟁 당시 제정된 미국 법률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연방 정부에 주요 산업에 대한 직접 통제 권한을 부여한다. 대다수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제적 설문’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설문조사 항목은 기업으로선 매우 민감한 고객사 정보와 반도체 재고, 주문, 판매 등 기업의 내부 정보를 망라한 26가지 문항으로 돼있다.
이미지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칩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1/08/20211108145042310821.jpg)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칩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다만 미 상무부는 처음의 강경한 자세에서 한발 물러나, 고객사 정보의 경우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했다. 이런 분위기 덕에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다수의 기업들은 ‘일반인 비공개’와 ‘공개’ 중 비공개 정보 제출을 택했다. 고객사 정보도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밝힐 수 없다”며 사실상 정보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미국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지만,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고객사 정보 공개에 따른 소송 등 후폭풍을 우려한 탓이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이번에 획득한 각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방대한 ‘반도체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자국 내 반도체 수급 차질 상황 해결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과 연구소를 상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R&D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제조기반 확충을 위해 삼성전자, TSMC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그 대가로 투자를 결정한 글로벌 기업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제스처는 최근 열린 G20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등 14개국 정상과 첫 공급망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에 획득한 정보를 당장은 후방산업 영향력이 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문제 해결에 활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중국 견제 카드로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보 제출 요구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계속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리딩 기업으로선 미국에 제출한 정보가 인텔 등 미국 기업에 흘러들어갈 것을 우려한다.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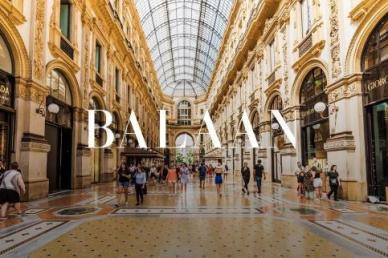

![[포토] 눈물 닦는 김수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171329906353_518_323.jpg)
![[포토] 경북산불 최초 발화지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115135593464_518_323.jpg)
![[포토] 마무리되어가는 경북산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000434389190_518_323.jpg)
![[포토] 흐드러지게 핀 유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00031718157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