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왼쪽부터)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사진=아주경제 자료실]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은 노동계의 입지를 오히려 좁혀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동을 존중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운다는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펴고 있지만,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는 뒷전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사 관계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경제가 좋으면 서로 나누고, 경제가 어려우면 양보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제 자체가 피해를 본다. 노사가 같이 피해를 보는 만큼, 서로 유연한 측면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경제상황에 따라 노사가 더 주장을 해야 할지, 양보해서 힘을 축적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서구의 노조는 상황에 따라 양보를 해서 그에 따라 무엇을 얻어갈지를 따지는데, 우리는 원론적으로 원하는 것만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정부는 보수정권이다보니 사쪽에 힘이 실렸다. 현재는 진보정권인데, 이럴 때일수록 노동계가 정책 주도권을 쥐면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독일의 경우, 오히려 노조가 정부와 정책대결을 펼쳐 설득을 통해 노동자들이 얻어갈 수 있는 방안을 리드해 간다"고 전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노사정 모두 사회적대화 자체에 굉장히 선언적인 구호만 하고 있을 뿐, 그에 임하는 용기와 인내 관점에서 보여주는 게 없다"며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입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곤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민노총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단순히 물리적인 행사보다는 훨씬 더 실효성있는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수정부 당시 노동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화의 토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그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이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는 정부여서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며, 사회적 대화에서도 상호 신뢰라는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일방적으로 노동자 또는 사용자 편을 드는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와 사는 대립적이고 서로 무기를 갖고 있으며 , 둘다 이해집단인 만큼 각자 이해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자칫 보수와 진보 등으로 나뉘어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노와 사만 있는 게 아니며, 청년구직자를 비롯해 비경제인구 등 노사에 포함되지 않는 계층이 많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상 편에 서고, 잠재적인 구직자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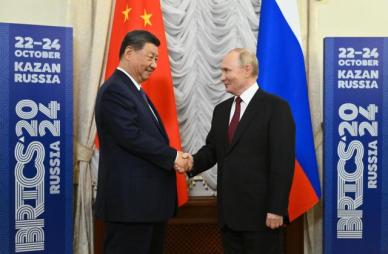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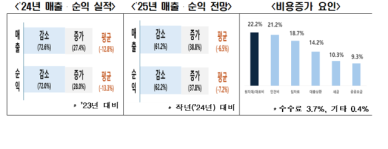

![[포토]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105538654937_518_323.jpg)
![[포토]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3.00→2.7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105904720186_518_323.jpg)
![[포토] 배우 김새론 발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21051906909_518_323.jpg)
![[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21 첫 시험비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5144535701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