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민간기업의 4차 산업혁명,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
② 규제 피해 日에서 꽃피우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④ 날개 단 中·日 자율주행차 연구… 韓 '거북이 걸음'
⑤ 해외 진출 준비하는 中 카풀 업체 VS 국내 입지도 좁은 韓 카풀업체
⑥ 핀테크 가로막는 '은산분리' 日은 폐지, 韓은 그대로
⑦ 中 헬스케어 급성장... 韓 규제와 정치가 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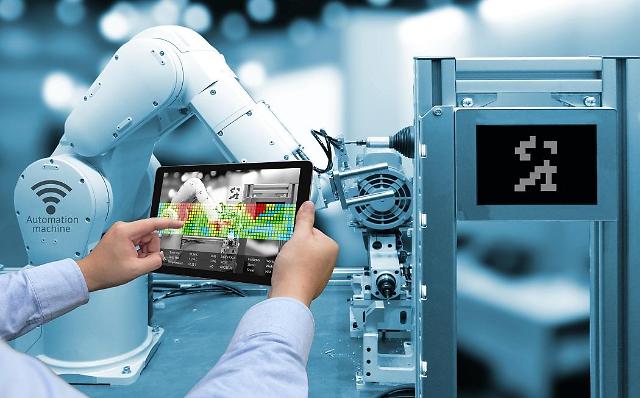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 중 하나인 의료 부문에서도 한국은 제자리걸음만 하는 모양새다. 각종 첨단 바이오기술은 차치하고서라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의 발전이 더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종 정치현안과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요 화두는 모바일헬스케어와 빅데이터의 유연한 이용이다. 의사와 환자 간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기술력이 메워주는 방식이다. 시장의 전망도 장밋빛이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는 1420억 달러(약 151조원)에 달한다. 2020년에는 2060억 달러(약 219조원)까지 성장한다는 전망이다.
중국의 헬스케어 분야 성장속도는 더 가파르다.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기업 텐센트는 최근 영국 인공지능(AI) 의료 기업 바빌론헬스(Babylon Health)와 위챗으로 질병진단이 가능한 AI 알고리즘 개발에 나섰다. 모두가 사용하는 메신저 앱에 의료서비스가 투입되는 셈이다. 텐센트는 앞서 중국 온라인 의료 서비스 기업 위닥터(We Doctor)와 AI 기반 건강 관리 및 생명과학, 바이오 등 솔루션을 만드는 스타트업 아이카본엑스(iCarbonX)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곳곳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헬스케어 분야 선도 경쟁은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기술은 뒤떨어지지 않지만 각종 규제와 이해집단의 갈등 탓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에선 의료법 제34조 1항에서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와 사회적 논의를 구실로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규제 장벽에도 불구하고 각 대형병원은 해외의 업체와 기술협력을 늘리는 추세다.
황희 서울대병원 교수는 "기술적인 성숙도로 봤을 때 한국이 전혀 뒤처지지는 않지만 시기상으로는 의료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정부 각 부처에서는 20년 동안 원격진료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없이 시행해 왔다"며 "지금부터 10년 전을 돌이켜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적 씨앗을 빠르게 성장시켰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서비스를 하는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이 있고 실제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국은 기술적으로 빠르게 성숙하다 보니 정책이나 규제 부분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 성숙과는 별개로 서비스로 변환되거나 시장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미흡하고 병원에서도 의료 데이터의 이용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황 교수는 한국과 대비되는 중국의 발빠른 의료시장 개방이 긍정적이라고 단언하지 않았다. 황 교수는 "중국의 독특한 사회정치 체제 덕분에 빠르게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이 뒤처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나중에 중국에 완전히 뒤처지게 된다면 그땐 추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에 힘을 쏟을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미세먼지는 좋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6/20250316062142985743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故 휘성, 영정 사진 속 환한 미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131052257994_518_323.jpg)
![[포토] 홈플러스, 정산 대금 3400억 지급…현금 1600억 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104411947330_518_323.jpg)
![[포토]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 후 업무 복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3/20250313120924594304_518_323.jpg)
![[포토] 국민의힘, 헌재 앞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3/20250313120803802996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