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5/01/20170501180703962441.jpg)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5·9 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은 시대를 꿰뚫는 창이다. 회귀투표 성격이 강한 총선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선마다 체제를 뒤흔드는 시대정신이 존재했다. 해방 직후 ‘건국화’를 시작으로 1970∼80년대 ‘산업화’, 1990년대 ‘민주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갈 길은 멀다. 퇴행적 정치도, 1%가 99%를 독점하는 경제 권력도 여전하다.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구체제와의 결별을 선언할 새 시대 장자를 맞는 선거라는 얘기다. 이에 본지는 5·9 대선의 숨은 부분을 찾아 ‘공유·분권·자치·통일’ 등 포스트 신(新) 질서를 모색한다. <편집자 주>
조기 대선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돈’이다. 각 대선후보들이 재원 없는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악순환의 도돌이표였던 ‘재정 조기 집행→재정절벽 우려→추경 편성’ 등이 새 정부 초기 정권에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다. 나랏빚은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향후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후보 5년간 공약이행비 ‘1230조’
원내 5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 이행 비용은 5년간 총 1230조원 규모다.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각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문 후보는 178조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90조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4조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08조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 550조원(이상 5년 기준) 등이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문 후보 35조6000억원, 홍 후보 18조원, 안 후보 40조9000억원, 유 후보 41조6697억원, 심 후보 110조원 안팎이다. 원내 5당 대선후보의 1년 공약이행비 총량은 246조원 수준으로, 올해 정부예산(400조7000억원)의 과반이다. 나랏돈을 쌈짓돈 삼아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특히 문제는 각 대선후보들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연금부담 등과 맞물릴 경우 경제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 규모(채무발생 시점 기준)는 2012년 902조1000억원에서 2013년 1117조9000억원→2014년 1212조7000억원→2015년 1293조2000억원 →2016년 1433조1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전년도 대비 증가한 국가부채의 3분의2가량(92조7000억원)은 연금충당부채였다.
이미지 확대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각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문 후보는 178조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90조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4조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08조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 550조원(이상 5년 기준) 등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5/01/20170501180740930020.jpg)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각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문 후보는 178조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90조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4조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08조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 550조원(이상 5년 기준) 등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나랏빚, 미래세대 부담··· “민간투자가 해법”
반면 19대 대선 유권자층만 보더라도 ‘고령화’는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이번 대선의 총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60대 이상은 1036만2877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4.4%다.
이어 △40대 873만6420명(20.6%) △50대 847만7808명(19.9%) △30대 747만3957명(17.6%) △20대 676만6천283명(15.9%) 순이다.
5060세대의 유권자 비율은 지난 대선 대비 4.3%포인트(40%→44.3%) 증가한 반면, 2030세대는 각각 0.6%포인트(18.1%→17.5%)와 2.5%포인트(20.1%→17.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력 감소와 국내총생산(GDP)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복지 확대 등 재정지출 증가대로 이어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 회원국 평균 25.1%보다 낮다.
새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성장이든, 일자리든 해법은 민간에 있다”며 “새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민간경제가 활력을 잃는다면 더 큰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명동 한국 YWCA연합회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5/01/20170501180818660202.jpg)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명동 한국 YWCA연합회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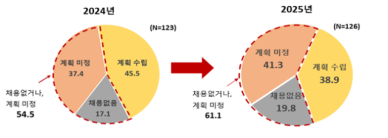



![[포토] 정몽규 축구협회장, 4연임 확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6/20250226231154570473_518_323.jpg)
![[포토] 한동훈,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6/20250226111638907860_518_323.jpg)
![[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6/20250226111836337381_518_323.jpg)
![[포토]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224632550590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