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정치부 이정주 기자]
각 후보 캠프와 교수, 정치평론가 등 모두 입을 모아 이번 대선에서는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말라고 외친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기자조차 네거티브라는 용어가 지닌 ‘이미지’ 때문에 무심코 비판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대로 된 네거티브’ 공방에 찬성한다. 아니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본다.
네거티브 전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부정적이거나 반감을 살만한 것들을 부각시키는 방법’이라고 정의돼 있다. ‘반감을 살만한 것을 부각시키는 행위’가 선거에서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 잘못됐다고 말할 순 없다.
대표적인 근거로 지난 2012년 대선을 들 수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향해 문재인 캠프나 시민단체 등이 제대로 된 검증을 펼쳤다면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지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 의혹을 제기했다면 아마도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열을 냈을 게 뻔하지만 말이다. 후보 검증, 즉 ‘제대로 된 네거티브’를 간과한 대가를 대한민국은 4년 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게 된 셈이다.
혹자는 ‘그렇다고 해서 네거티브를 옹호하는 것이냐’며 반박할 수 있다. 네거티브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묻고 싶다. 올바른 검증과 네거티브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고 지난 대선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근거 있는 의혹제기’에 수렴될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선거판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필요악’에 해당한다고 본다.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나 비리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네거티브’라는 딱지를 붙이면 사실상 어떤 의혹도 밝혀낼 수 없다. 제2, 제3의 최순실을 선거판에서 걸러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흠이 많은 후보일수록 네거티브 선거전을 싫어하기 마련인데, 네거티브를 자제하면 이를 도와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깨끗한 선거’를 외칠수록 가장 더러운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주는 역설에 빠지는 셈이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의 한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국감장에서 한 야당 의원이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증인으로 참석한 장관들은 비웃음을 가득 띤 얼굴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박했다. 두달 후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의혹 제기를 비웃음으로 맞받아쳤던 장관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국감장의 장관들을 탓하는 게 아니다. 그들도 ‘설마...’라고 생각했을 거라 믿는다.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선거제도 또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불완전’을 인정하는 데서 생산적 논의가 시작된다.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네거티브적 시각’이 필요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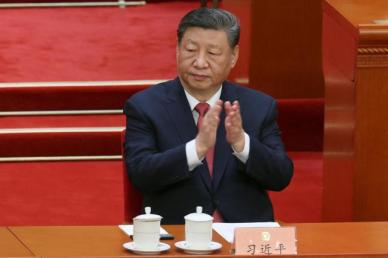

![[포토] 고 김새론 유족 측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163131109279_518_323.jpg)
![[포토] 청송휴게소 할퀴고 간 산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102008427189_518_323.jpg)
![[포토] 이재명 대표, 2심 무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6/20250326160602449127_518_323.jpg)
![[포토] 2025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2025 APFF)](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6/20250326100935654866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