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래 OK시골 대표(시인)
어찌 사랑만 하며 살겠는가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 수 있겠는가
그 아침 꽃잎에 맺는 이슬에서
감사함을 배우고
내 발을 담근 거친 흙 한 톨
정수리를 태우는 뙤약볕
소나기 한 줄의 의미가
지극한 생명이라는 것도 알아
저물녘 물소리가 슬프거나 슬퍼지면
막연히 그리워지는 것들도 있어
빈 뜰서 간간한 바람과 살 때
누군가를 그리다 기다리다 보면
소식 없는 것들은 미움이 아니라
지독한 사랑
그리 살다 무엇이 되었지
무엇이 되려 사는 게 아니었네
-----
봄이다. 며칠 전만해도 속이 얼어 괭이가 먹지 않던 땅이 녹아 보드라운 새살을 드러냈다. 마당가 양지쪽에서는 돌나물 싹이 푸릇하다. 버들개지는 벌써 폈고 생강나무 꽃순은 부풀어 올라 금방이라도 노랗게 꽃이 맺힐 것 같다. 날 풀리면서 생각했던 나무를 부랴부랴 옮겨 심는다. 이 계절도 순간이다. 지나치면 때를 놓치고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한다.
지난 겨울의 폭설과 작년 여름의 태풍도, 뙤약볕도 지나쳐 어김없이 봄이 왔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까마득하다.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들, 되고자 했던 것들도 그렇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저절로 된 것들이지 억지로 된 것들은 하나도 없다.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살다보니 하나 둘 여물어 결국 무엇이 되었다.
봄이 그렇다. 살다보니 또 봄을 맞는다. 이 봄을 열심히 살다보면 풀이고 나무고 꽃이고… 무엇이 돼 있을 것이다.
내일엔 텃밭에 흙을 좀 더 들여야겠다. 싸게 나온 흙이 있다고 단골 포크레인 기사가 일러줬다. 마음이 들뜬다. 그러고 보니 봄은 흙이다.

돌나물꽃 [사진=김경래 OK시골 대표(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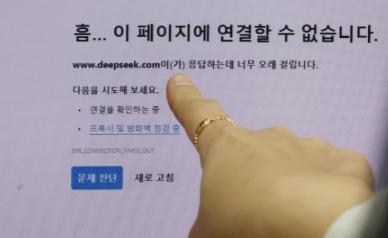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