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J E&M 로고]
CJ E&M과 KBS가 자체 콘텐츠 제작사를 들고 나왔다. ‘우리 방송사에서 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이들 채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 제작사는 울상일 수 밖에 없다.
KBS가 내달 설립하는 몬스터 유니온은 구성원 면면이 화려하다. CEO 자리에 싸이더스 매니지먼트 본부장을 거친 박성혜 대표를 앉히고 ‘태양의 후예’를 성공으로 이끈 문보현 전 KBS 드라마국장에게 드라마부문장을, ‘개그콘서트’의 수장으로 이름을 떨친 서수민 CP에게 예능부문장을 맡겼다.
콘텐츠 공룡이라 불리는 CJ E&M은 더욱 강력하다. 드라마 사업부를 분리, 드라마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을 설립하고 ‘태양의 후예’, ‘상속자들’ 등을 집필한 스타 작가 김은숙이 소속된 화앤담픽쳐스와 ‘별에서 온 그대’를 집필한 작가 박지은 작가와 배우 전지현, 박민영, 조정석이 속한 문화창고를 인수했다. 이제 CJ E&M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유한 스타 작가가 집필한 대본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속한 킬러 배우를 섭외하고 CJ 계열사 제품 PPL을 듬뿍 담은 드라마를 CJ E&M이 보유한 18개 채널에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완벽한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셈이다.
A 대표는 “KBS, CJ E&M 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만들면 당연히 SBS와 MBC도 만든다. 하나만 만들리라는 보장도 없다. 자체 제작사를 두 개를 만들지, 세 개를 만들지 누가 아느냐”며 걱정했다.
또 다른 제작사의 B 이사는 “CJ E&M의 스튜디온 드래곤은 CJ E&M의 18개 채널 콘텐츠 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 드라마도 제작하는 실정이라 외주 제작사에 위협적인 존재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인수한 문화창고가 자사에 소속된 전지현을 주연으로 해 만든 ‘푸른 바다의 전설’은 SBS에서 11월에 방송된다.
물론 기계식 생산이 어려운 콘텐츠라는 특성상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영 불가능한 건 아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돋보이는 콘텐츠가 뜻하지 않은 ‘대박 신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왕왕 있다. KBS, CJ가 몬스터 유니온과 스튜디오 드래곤의 설립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외주 제작사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로 승부를 보면 되지 않느냐’고 대꾸하는 이유다.

[사진=스튜디오 드래곤 로고]
C 제작사 대표는 “방송사의 자체 제작사 설립은 지상파의 독과점을 막고 제작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가 부분 폐지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인 만큼 콘텐츠의 다양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채널이 40% 수준, 종합편성채널이 15% 수준으로 외주 제작사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 채널의 경우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체 콘텐츠로 편성표를 모두 채울 수 있다.
C 대표는 “다양성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기획이 치열하게 경쟁할 때 확보된다. 한정적인 사람이 만들고 소수의 결정권자가 승인을 내리는 구조에서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지 의문”이라면서 “19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가 왜 나왔는지를 떠올려야 한다. 방송사가 자체 제작사를 설립하는 것은 지상파가 찍어내듯 만든 획일화되고 천편일률적인 콘텐츠가 만연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의 역할은 외주 제작사가 각자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끔 넓은 돗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류 붐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K-배터리 도전 직면] 완성차 잇단 마이웨이... LG·SK·삼성 파운드리 공장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061807664275_388_136.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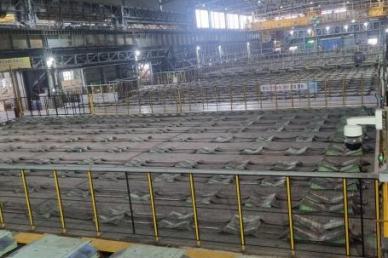
![[포토]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 후 업무 복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3/20250313120924594304_518_323.jpg)
![[포토] 국민의힘, 헌재 앞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3/20250313120803802996_518_323.jpg)
![[포토] 국민저항권 강연 하는 전한길 강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2/20250312130548505472_518_323.jpg)
![[포토] 대한항공 새 CI 입힌 항공기 도장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1/2025031123562092362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