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파네라이 라디오미르 1940 3데이즈 [사진=파네라이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1/15/20151115163904922411.jpg)
파네라이 라디오미르 1940 3데이즈 [사진=파네라이 제공]
각 시계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슬로건 중에서도 파네라이의 이 문구야말로 자사의 방향성과 오리지널리티, 역사성을 가장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보여주는 명문이다.
반면 오메가는 “The sign of excellence”, 즉 우수함의 표상 또는 상징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짧긴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렬함은 약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누구나 오메가를 ‘우수함의 상징’으로 여기질 않기 때문이다.
예거 르쿨트르는 “시간의 중심에서 랑데부(Rendez-vous at the heart of time)”라는 문구를 강조한다. 쉽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지만 충분히 예술적인 표현이다. 예거의 미학적 디자인과 마감을 특히 중시하는 미술적 완성도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시적인 표현이다.
IWC의 슬로건은 “Since 1868. And for as long as there are men”이다. 1868년에 시작되어 인류가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인데, 마치 정치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선동적이다. 단순히 시계가 아닌 슬로건이라는 개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성공적인 글귀다. 한번만 들어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기 때문이다.
보석을 놀라울 만큼 화려하고 정교하게 세팅하거나 또는 각종 복잡한 기능들을 잔뜩 설계해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프랭크 뮬러는 그간 해왔던 행보가 슬로건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복잡함의 거장(Master of complications)”
누가 봐도 프랭크 뮬러다운 슬로건이란 걸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초고가의 하이앤드 모델로 유명하지만 손목시계 브랜드 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바쉐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제작자(The oldest watch manufacturer in the world)”를 슬로건으로 외친다. 오래된 게 능사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최고 기술력의 하이앤드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계 제작을 시작해 그만큼 노하우와 역량도 최고라는 우월감이 깔려 있다. 평범한 문구 속에 높은 긍지(프라이드)를 내포한 잘 만든 슬로건이다.
보메 메르시에의 슬로건은 “시간은 내거다(Time is mine)”
단순 명확하고 대중적인 표현이다.
부로바는 중저가 브랜드임에 비해 슬로건에선 기술적 긍지를 주장하고 있다. “세대에 걸쳐 아메리카에 시간을 알려줬다(Keeping America's time for generations)”와 “주목받기 위해 만들어졌다(Designed to be noticed)”가 그것이다. 아큐트론 라인을 비롯해 부로바는 시계 기술력에서 고가에 버금가는 완성도로 유명하다.
제니스의 슬로건은 “1865년에 시작된 개척자 정신(The pioneer spirit since 1865)”이다. 언뜻 보면 미국적인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시계 역사에서 제니스가 보여준 놀라운 기술력을 생각할 때 진정한 ‘파이오니어’인 것만은 확실하다. 제니스가 세계 최초로 고안한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는 시간당 36000 진동수의 하이비트를 자랑하는 무브계의 혁신적 기기다. 기존의 무브먼트가 시간당 28800 진동수였던 것에 비한다면 놀라운 기술력이다. 시간당 진동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태엽이 고속으로 움직이며 오차율을 더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제니스의 기술력은 슬로건에서 말하는 것처럼 파이오니어로서 다양한 시도들을 선보인 바 있다.
한국에서 어느덧 국민시계처럼 돼버린 티쏘의 슬로건은 “디테일에 신경 쓰다(Take care of details)”와 “전통 이노베이터(Innovations by tradition)”다. 저가의 가격임에도 가격대비 최고의 만족도가 티쏘의 매력이다. 예를 들어 티쏘의 인기 드레스워치인 르로끌의 경우 고가에 사용되는 ETA 무브를 탑재하고 착용감 좋은 브레이슬릿과 마감 처리 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티쏘 슬로건의 대표적인 예다.
까르띠에는 “150년의 역사와 로맨스(150years of history and romance)”를 모토로 한다. 단지 시계로 끝나지 않고 각종 예술 분야와의 콜라보 및 아티스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그리고 아름답고 세련된 디자인에 승부를 거는 까르띠에의 면모를 ‘역사’와 ‘로맨스’라는 단어로 압축한 설득력 있는 슬로건이다.
리처드 밀은 역사도 짧고 가격대도 매우 비싸다보니 일반인에겐 좀 생소한 브랜드였다. 하지만 영화 ‘파커’에서 제이슨 스태덤이 리처드 밀 크로노그래프를 착용하고 나와 일반인들에게 화제가 된 바 있다.
리처드 밀은 고가의 시계임에도 단아한 드레스워치보단 스포츠 등 좀더 역동적인 모델에서 우위를 보인다. “손목 위의 레이싱 머신(A racing machine on the wrist)”이란 슬로건만 봐도 이 시계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태그호이어는 “1860년 이래 스위스 아방가르드(Swiss avant-garde since 1860)”가 슬로건이다. 항상 통념을 깨고 앞서 나가는 시계를 강조하는데, 태그호이어의 최상위 라인인 그랜드까레라의 36RS 모델은 이러한 정신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하는 예다.
또한 “역사는 매일 아침에 시작한다(History begins every morning)”도 태그호이어의 슬로건이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할 때 시계를 착용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걸 뜻하는 문구다.
시티즌의 슬로건은 “세계가 시간을 아는 법(How the world tells time)”이고, 스위스아미는 “앞으로 남은 날들, 뒤에 남겨진 역사(Life ahead of you, a legacy behind you)”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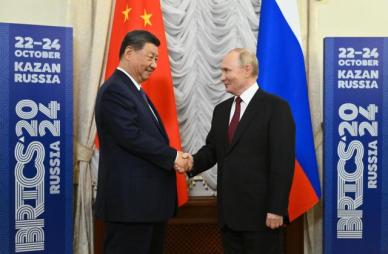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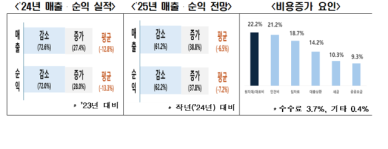

![[포토]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105538654937_518_323.jpg)
![[포토]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3.00→2.7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105904720186_518_323.jpg)
![[포토] 배우 김새론 발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21051906909_518_323.jpg)
![[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21 첫 시험비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51445357011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