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오제호]
우리는 하얼빈 의거의 주역인 안중근 의사를 기억한다.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처단함으로써, 일견 안 의사의 의거는 하얼빈역 광장에서 끝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 의사가 계획한 ‘정의를 되찾는 큰 일’은 의거 이후에도 안 의사의 순국일까지 5개월간 맹렬히 이어졌다.
이는 의거의 대의를 밝히고 임박한 국권피탈에 대비해 국민정신을 고취하려는 의거의 연장선 격이었고, 일본에 항거하는 제2의 의거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국권피탈 이후의 의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9월에는 대한의 광복을 위한 의거가 세 차례나 있어, 이를 결행한 세 의사(강우규, 박재혁, 김익상)를 통해, 의거 이후에도 지속된 의로운 투쟁을 조명해 보겠다.
1920년대 초 연이은 의거로 식민통치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의 對의거 조치는 한결같았다.
기소 측 의견에 경도된 재판, 고문 등을 통한 의사의 명예실추, 사실의 호도를 통한 조선인의 독립의지 상실 등이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때문에 세 의사는 사형을 피하기 어려웠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보였다.
하지만 일본이 의사들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을지언정 의사들의 정신만큼은 어찌할 수 없었다. 감옥에 구금되어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신들이 행한 의거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
어떠한 정의도 기대할 수 없는 재판이었지만, 세 의사의 의기는 법정에서도 빛났다.
김익상 의사는 “이후로 제2의 김익상, 제3의 김익상이가 뒤를 이어 나타나서 일본 대관 암살을 계획하되 어디까지든지 조선독립을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이번 일에 대하여는 조금도 뉘우침이 없다.”라며 완강한 항일의지를 표현했다.
강우규 의사 또한 일본인 판사로부터 ‘강 선생’이라는 존칭을 이끌어 냈을 정도로 법정에서 당당했고 태연했다.
형 집행을 기다리는 옥중에서도 세 의사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강우규 의사는 옥바라지를 하던 아들이 슬퍼할 때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이 부끄럽다’며 자책했고, ‘순국으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주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며 의거의 진심이 청년들에게 전해지기만을 바랐다.
일본인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긴 박재혁 의사는 식음을 전폐해 옥중에서 순국했는데, 이는 의거의 함의를 민족에게 전달하려는 박 의사의 최후의 노력이자 궁극의 투쟁이었다.
1920년 11월 29일 서대문감옥 사형장에서 일본인 검사는 강우규 의사에게 죽음을 앞둔 감상이 어떠냐는 짓궂은 질문을 했다.
강 의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단두대에 올라서니 오히려 춘풍이 감도는구나 /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랴”라는 절구(絶句)로 응했다.
광복을 위한 순국이기에 단두대 위로 불어오는 죽음을 재촉하는 칼바람도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으나, 일제강점의 현실만큼은 한(恨)스럽다는 것이다.
임박한 죽음이 어찌 두렵지 않았으랴마는 강 의사는 최후까지 의연하고 당당했다.
독립운동의 고취·독립의지의 대내외적 선창이라는 의거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의거 이후 투쟁의 중요성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 의사는 의거 이후에도 맹렬하게, 때로는 냉철하고 의연하게 광복이란 사명이 주는 무게를 견디어 냈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재판과 문초 및 형 집행의 과정에서 이들의 행적은 일제에 두려움을 주었고 민족의 귀감이 되었다.
저들을 두렵게 하고 우리에겐 모범이 된 세 의사의 옥중 투쟁이 있었기에 이들의 의거는 의거로서 민족에게 기억될 수 있었고, 미래의 의사를 꿈꾸었던 청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민족의 독립역량의 신장(伸張)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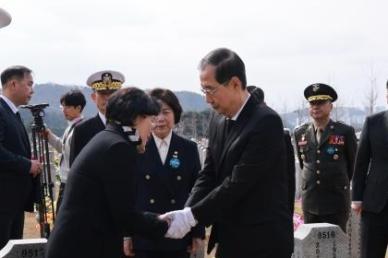


![[포토] 산불 헬기 순직 박현우 기장 빈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212316665495_518_323.jpg)
![[포토] 고 김새론 유족 측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163131109279_518_323.jpg)
![[포토] 청송휴게소 할퀴고 간 산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102008427189_518_323.jpg)
![[포토] 이재명 대표, 2심 무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6/20250326160602449127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