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폭스바겐 '남들에겐 질투, 당신에겐 기회' 광고 캡쳐 장면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어 김 과장, 폭스바겐?" 넥타이를 맨 남성은 지하주차장에서 만난 김 과장이 CC를 타자 이렇게 말한다. 직장 후배가 폭스바겐을 탈 줄 몰랐다는 뉘앙스다. 또다른 장면도 마찬가지. 딸 친구인 지수의 엄마가 티구안 트렁크를 열자 "어 지수엄마, 폭스바겐?" 부러워한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만난 처남이 제타를 타고오자 "처남, 차 바꿨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자동차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TV광고다. 15~30초 짧은 시간안에 제품의 매력적인 면을 보여줘, 구매욕을 당기거나 메시지를 던져 감동을 받게 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필요하다.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부자들만 탈 수 있는 고급차량만 제조되는 현실을 탐탁지 않아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탈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의 생산을 원했고 그 시초가 폭스바겐 비틀(딱정벌레)이다.
유독 국내 수입차시장은 고급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지만, 폭스바겐은 태생부터 저렴하고 실용적인 자동차를 모토로 만들어진 것이다.
오히려 이런 질투 콘셉트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의 고급브랜드에 더 어울릴만하다.
이미지 확대

폭스바겐 비틀을 위한 광고 캠페인으로 1962년 광고 대행사 도니데일번바크(DDB)의 줄리안 코닉(Julian Koenig)이 제작했으며 20세기 베스트 광고 크리에이티브로 뽑혔다.
폭스바겐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폭스바겐은 왜 고장난 자동차를 광고했을까?’라는 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보통 광고에 결점이 있는 상품을 들고 나오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달랐다. 1961년 폭스바겐 인쇄물에 딱정벌레 모양의 자동차 비틀의 흑백사진 아래 'Lemon(레몬)'이라는 카피가 실렸다. 광고에는 '이 차는 앞좌석 사물함 문을 장식한 크롬 도금에 작은 흠집이 나있어서 교체해야 합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일하는 크루트 크로너라는 검사원이 발견 했습니다'라는 자막도 함께 담겼다.
얼마나 엄격한 품질검사에서 불량판정을 받게 됐는지 보여준다. 이 광고로 정직함을 더한 폭스바겐은 비틀이라는 상품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책 저자인 자일스 루이의 "훌륭한 광고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준다"는 언급처럼 1961년 폭스바겐 광고는 작은 품질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브랜드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다.
폭스바겐 브랜드는 올해 한국법인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법인 설립 이전에 판매대수는 929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3만719대를 판매, 30배가 넘는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질투'를 유발하는 과시욕 대신 '자동차 본질'에 집중해 뛰어난 상품성과 탄탄한 라인업으로 승부처를 삼아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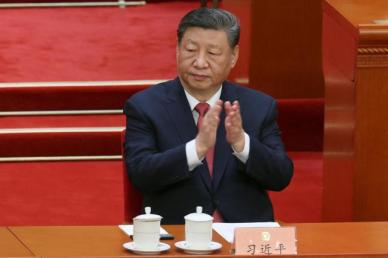

![[포토] 고 김새론 유족 측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163131109279_518_323.jpg)
![[포토] 청송휴게소 할퀴고 간 산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102008427189_518_323.jpg)
![[포토] 이재명 대표, 2심 무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6/20250326160602449127_518_323.jpg)
![[포토] 2025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2025 APFF)](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6/20250326100935654866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