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과 대한상의의 관계는 할아버지인 매헌 박승직 창업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포목 행상으로 전국을 떠돌며 기반을 닦아 1896년 종로에 개업한 '박승직 상점'은 두산그룹의 모태다.
서울지역 대표상인으로 활동하던 그는 1906년 일본 상인의 횡포에 맞서 종로 육의전 상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한성상업회의소'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한성상업회의소는 서울상공회의소의 전신이다. 해방 직후 한성상업회의소와 지방 상공회의소들이 연합해 '조선상공회의소'를 설립했으며 이후 대한상의로 발전했다.
이처럼 두산그룹과 상의의 인연은 후대에도 이어져 박용만 회장을 더해 130년을 앞둔 대한상의 역사상 14명에 불과한 회장에 두산그룹에서만 4명을 배출하게 됐다.
고(故) 박두병 전 회장은 1967∼1973년 6년간, 국내 최초의 전문 경영인으로 두산그룹 회장을 역임한 정수창 전 회장은 1980∼1988년 8년간 대한상의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박용만 회장의 형인 박용성 전 회장은 2000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5년 반 동안 상의를 이끌었다.
여기에 네 번째 회장으로 박용만 회장을 배출하게 되는 두산그룹에는 많은 의미를 갖는다.
소비재 위주에서 중공업과 인프라사업 중심으로 그룹 전체의 주축 사업구조 변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박용만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리에 오른 것은 글로벌 경영을 확대하고 있는 두산그룹의 위상을 한 차원 높여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라는 것이다.
물론 회장 취임 후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대외업무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은 것이 두산그룹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이후 글로벌 경영위기로 인해 중공업 관련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는 등 위기 경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박용만 회장 자신이 직접 고안한 새로운 기업가치인 '두산 웨이(way)'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박용만 회장을 주축으로 한 그룹 최고 경영진 구조가 지금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더 많다. 두산그룹은 그룹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맏형인 박용곤 명예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등 박용만 회장의 형제들과 조카인 박정원 (주)두산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다 함께 참여하는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다시 각 계열사에 있는 전문 경영인들과 함께 실행에 옮기는 집단경영 체제를 안착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박용만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두산그룹은 두텁고 능력이 뛰어난 많은 최고경영진이 있기 때문에 경영 공백의 우려가 없다"며 "이러한 장점 때문에 박용만 회장도 안심하고 상의 회장직을 수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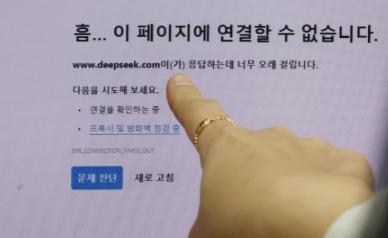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