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임차인의 보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임차인 서씨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임차인들 스스로가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쌍은 지난해 3월 2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등기신청일은 같은해 5월 30일이다.
이에 앞서 임차인 서씨는 전 건물주와 2010년 10월 2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각각 4000만원, 300만원으로 이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면 3억4000만원 수준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서울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2억5000만원, 광역시와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1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애초에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임차인 서씨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씨는 리쌍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갈등이 점화됐다. 서씨는 전 건물주와 구두로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은 확인할 길이 없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 의해 정당하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이전 계약을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도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리쌍 측은 “지난해 12월 무상임대 3개월에 보증금 제외 1억원의 조건을 제시했다”며 “명도소송 진행과정에서 재판부의 1억1000만원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서씨가 이의신청해 무산됐다”고 해명한 상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상가의 25%만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나머지 75%는 법의 테두리 밖에 놓인 셈이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리쌍이라는 유명인을 통해 크게 드러났을 뿐”이라며 “객관적으로 따지면 서씨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는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 상가 전문가는 임차인 서씨가 월세 200만원에 최초계약을 맺었지만 임대료가 300만원까지 점차적으로 올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현행 법상에서는 임차인들이 계약 사항을 꼼꼼하게 따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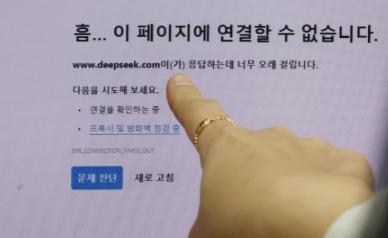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