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상영관은 이 영화가 제작단계부터 3D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더 많은 3D 상영관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는 한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극장들이 반색한 것은 흥행 보증수표인 해리포터가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3D로 개봉했기 때문이다.
일반 영화 요금이 9000원 선인데 비해 3D 영화 요금은 50%가량 비싼 1만3000~1만4000원 수준. 1000만 관객이 봐야 벌 수 있는 돈을 3D 영화는 700만명으로도 벌어들일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극장이 가져갔다는 데 있다.
각 극장들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황금타임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3D 영화로 배치했다. 때문에 3D를 선호하지 않는 관객도 비싼 값을 치러가며 색안경을 낀 채 영화를 보는 수고(?)를 겪어야 했다. 재화 공급과 가격 결정을 공급자가 정해버린 것이다.
공급자가 자신들의 편의와 잇속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박탈됐고, 가격 결정권도 공급자가 가져가버렸다. 수요·공급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란 도식이 깨져버린 셈이다.
최근 국내 정치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에 급급해진 정치권이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모두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은 공약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 회생, 대학등록금 완화, 기업의 상생경영 등. 시행방안을 두고는 각 당이 입장차는 있지만 큰 틀로 봤을 땐 판박이다. 이념은 사라진 채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만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민주정치의 현실은 입법권자 중심으로 일방향적일 때가 많다. 소비자로 생각할 수 있는 일반국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언대가 사실상 없다. 또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매우 힘든 구조다.
이 상황에서 정치권은 인기영합적인 상품을 팔며 소수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특수성과 다양성을 무시한 정치의 보편화. 정치권 스스로 대중이 물러나고 군중만 남은 사회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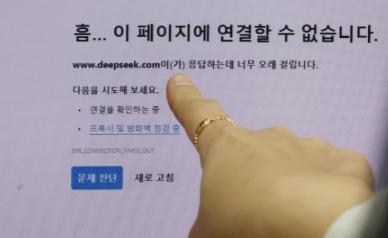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