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중국동포 B씨는 아들의 담임 교사에게서 최근 전화 한통을 받았다. 담임은 아들이 친구와 자주 싸운다며 전학을 권유했다. A씨는 “내가 조선족이라서 아들이 ‘차별’ 당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 이른바 ‘조선족’은 36만7631명이다. 이는 우리 국적을 갖지 않은 국내 체류 외국인 92만887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다. 지난 1992년 중국 조선족 사회에 한국 취업 바람이 분 이후로 전체 조선족 200만명 가운데 41만명이 한국을 다녀갔거나 현재도 체류하고 있다.
조선족은 우리 동포임에도 재미·재일 동포에 비해 차별 받으며 ‘2등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시름하고 있다. 차별과 ‘이방인’이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다.
이에 ‘차별적’ 인식의 전환과 고용 등에 대해 실효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면초가’ 조선족.. 결국 피해는 우리 사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조선족들의 수는 갈수록 늘어남에도 조선족들이 겪는 차별 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주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인 공장일이나 식당 종업원, 파출부 등으로 일하는 이들 조선족들은 주로 공단과 가까우며 집값이 싼 서울의 대림동과 가리봉동·봉천동· 자양동· 독산동· 신길동 등지에서 집단촌을 이루고 산다.
이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를 빼앗는 불만의 대상으로, 사업주들에게는 없으면 안되는 저임금 노동자로 인식되고 있다.
가리봉동 근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A씨는 “조선족들 때문에 오랜기간 일당이 오르지 않고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대변했다.
또 중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B씨는 “주변에 조선족들이 많아지면서 환경이 나빠졌다”며 “가게를 옮길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조선족들은 간병인이나 건설노동자, 목욕탕 때밀이, 육아 도우미 등으로까지 근로 영역을 넓히며 우리 사회로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
◆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 동시에 이뤄져야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정책적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9년 재미교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가난한 재외동포는 법적 대상에 서 제외됐다. 이들이 한국에 정주하게 되면 경제위기인 상황에서 이득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였다. 이에 조선족의 이미지는 변색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는 조선족을 불법체류 노동자와 보이스피싱 사기자 등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부산 부경대 예동근 교수는 조선족의 정부 지원의 시급함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다문화가족 중 조선족 비중이 가장 높은데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 고용 안정성이 악화된 것도 문제다. 중국동포는 조건이 까다로워 미국·일본동포처럼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지 못하고 5년 기한의 H-2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계 중국인들에게 불법체류 노동자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07년 3월부터 ‘방문 취업제’를 시행 중이나 내년 3월이면 당시 입국한 중국동포들의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것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주(駐)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에 따르면 방문 취업제로 국내에 취업한 한국계 중국인은 현재 30만3000여명. 이 가운데 6만여명은 기한 만료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귀국길에 올라야 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예전보다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새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서대학 이성일 교수는 조선족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개념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적·문화적 개념이 정리 되다보면 정책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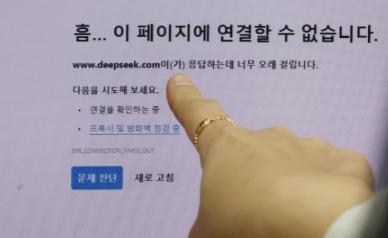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