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를 위한 대비에는 소홀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해 정치·사회 등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무상급식 논란'에 이어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감세추진을 통한 복지예산 마련까지. 복지는 그동안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좋은 것' 정도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생활밀착형 당면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사실 그동안 우리에게 복지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재정 혹은 '공적부조'로 일컬어지는 사회보장제도로 인식돼 왔다.
특히 건강보험료율이 지난달 대폭 인상되면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복지재정이 불러올 여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직접 체감하기도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도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007년 4.77%, 2008년 5.08%, 2009년 5.33%, 2010년 5.33%, 2011년 5.64%로 급증했다.
과연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언제까지 건보료 폭탄의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거의 '평생'이다.
생활밀착형 사회보험제도를 기치로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은 조건만 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평소에 모아 둔 보험료를 모든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 쓰겠다는게 취지지만, 문제는 국가재정을 갉아먹는‘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데 있다.
게다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의 청·장년층은 '받아야 할 것' 보다 '내야 할 게' 더 많아졌다.
'경제학'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라면 단연 '효율성 제고'를 생각하게 마련이다.
기본 명제는 확실하다. 앞으로 복지재정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균형'을 거론하지 않아도 국가재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복지재정 효율성은 당면과제이자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최대현안으로 급부상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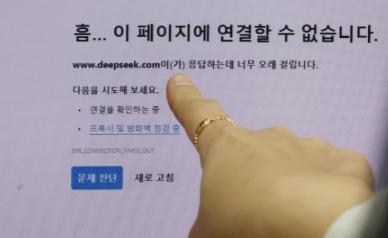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