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규직에서 밀려나는 것은 벼랑에서 밀려 '수렁'으로 빠지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로 인해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비판목소리 높아
현대차 노조는 내부의 비판에도 지난달 21일 대의원회의에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사측과의 단체협상 안건에 포함시켰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게 현대차 노조의 설명. 장규호 현대차 노조 공보부장은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미 채택된 제도”라며 “당장 실행 가능성도 없는 상징적 제도로, 회사를 키우는 데 기여한 직원에 일부 가산점을 주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상당수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신규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대채용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2008년 단협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혹은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을 명문화 했다. 한국GM도 같은 해 동일한 조항을 단협에 규정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동일한 조건일 경우 종업원 자녀를 우대하는 조항을 단협에 넣었고, 두산중공업도 업무상 재해 및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가족의 우선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정년 퇴직자 직계 가족이 자격을 구비했을 경우 우선 채용의 특전을 준다.
하지만 다음달로 예고된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 노사협상이 임박하면서 일자리 세습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명을 통해 “현대차지부의 ‘채용세습’ 논란은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일자리 대물림은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직업윤리연구소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외면한 대기업 노조의 이같은 행태는 한국 노동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불안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 부채질
이같은 비판에도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리해고 등 노동의 유연성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대기업 노조들은 ‘고용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 회사의 이익이 안정적이고 노조가 협상력이 있을 때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노조의 현실적 실리주의까지 더해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 10여년이 지난 지금 대기업 정규직은 고용의 안전성은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고 임금수준도 사회적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대급부로 기업들은 정규직 신규채용을 꺼리게 됐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은 늘어만 갔다. 신규채용시 직원 자녀 우대로 불거진 ‘직업 대물림’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또다른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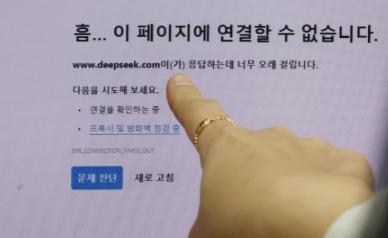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