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스마트폰 시대에 3세대(3G) 통신 서비스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LG유플러스 속이 바짝 타 들어가고 있다.
2.1 기가헤르츠(GHz) 대역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 말이다.
이 주파수가 없으면 차세대(4G) 서비스로 넘어 갈 수 없다.
애플 아이폰 등 외국산 스마트폰도 공급받을 수도 없고, 글로벌 자동 로밍도 안 된다.
하지만 이는 당초 LG유플러스가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 황금 주파수대라 불리는 800MHz 주파수를 획득했다. 이 때 2.1GHz에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는 2006년 2.1GHz 대역 40 메가헤르츠(MHz) 폭을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했다.
스마트폰이 1년 반 만에 1000만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는 등 ‘스마트혁명’이 몰고 올 파급력을 전혀 예측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음성과 데이터 위주의 2세대(2G) 통신 시대가 시장에서 당분간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LG유플러스가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는 현재 1.8GHz 대역을 통해 2G 서비스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LG유플러스가 반납한 대역 중 일부를 현재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원래 KT와 똑같이 2.1GHz 대역 40MHz 폭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해 5월 추가로 20MHz 폭을 넘겨 받아 총 60MHz 폭을 사용하고 있다.
2.1 GHz 주파수 폭은 120MHz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남아 있는 20MHz 폭을 경매에 붙일 예정이다.
이 20MHz 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 KT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수가 타사에 월등히 많다는 점을 내세운다.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절반을 웃돈다.
KT는 2.1GHz 주파수는 KT의 3G 트래픽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주파수라는 전략을 편다.
KT가 올 7월 2G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이를 꼭 따내야 한다며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김상수 LG유플러스 홍보팀장은 “그렇게 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 주파수를 60MHz, 40MHz, 20MHz씩 나눠 갖게 돼 공정 경쟁의 틀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일리는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은 곱지만은 않다.
LG유플러스가 앞서 할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인데, 이제 와서 공정 경쟁의 논리를 내 세운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시장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LG유플러스의 책임이 더 크다”며 “경매안은 시장 논리, 주파수 과거 배경 등을 여러 측면을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파수 경매제는 원하는 사업자가 많은 주파수 대역을 가격 경쟁을 통해 나눠 주는 제도다.
2.1GHz에 대한 최저가격은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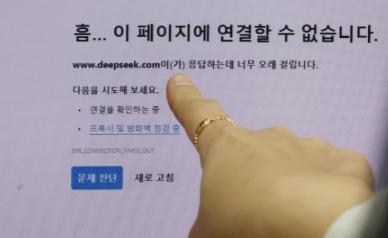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