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유럽 지역 외신 기자들이 ‘통화’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아세안+3가 앞으로 역내 국가 간 무역을 확대하고 결제시 각국 통화의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역내 국가 간 무역량을 늘리고, 무역 거래시 한국의 원화든 중국 위안화든 일본 엔화든 역내 통화 사용을 촉진한다.”
이는 아세안+3가 미 달러화 사용을 줄여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에 매달렸고, 많은 달러를 벌어 들이며 자연스레 ‘달러 시스템’에 예속됐다. 때문에 이들 국가의 ‘탈(脫) 달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세안+3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 및 달러와의 동조화(커플링)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아시아·미주·유럽 3대 블록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탈 달러가 순탄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아직은 미지수다.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북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5일 기자들과 만나 “아세안은 지역적 통합이라는 면에서 제일 느슨하다”며 “빨리 강력한 연합전선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국이 ‘아시아’라는 소속감을 갖고 경제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문화·경제·정치 등 각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또 중국·일본 등 역내 강대국 간 주도권 싸움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한 요시히코 노다 일본 재무장관은 회의 내내 ‘일본어’ 사용을 고수했다. 모든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영어를 사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동안 일본이 역내 경제를 주도해왔던 만큼 주도권을 뺏기기 싫다는 것이다.
중국 대표로 참석한 중국 리융 재정부 부부장은 이를 조용히 지켜봤지만, 경제규모로 이미 일본을 제쳤기 때문에 패권은 이미 넘어왔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통합 과정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국-일본 양국의 갈등이 첨예할 전망이며, 이를 중화할 현명한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ADB 총회를 통해 본격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금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CMIM은 다자간 통화스와프이기 때문에 위기 발생시 각국의 지원을 ‘보증’하기 어렵다. CMIM를 기금 형태로 발전시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이 밖에도 동남아 국가의 신용문제 및 통화 절상, 정치적 갈등 해소, 관세 완화,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낼 역내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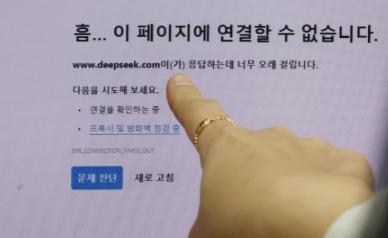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