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젊은 엄마들 ‘유기농’에 관심이 지대하다. ‘에코맘(Eco-Mom) 선발대회’가 열릴 정도다. 환경친화적인 살림에 앞장서고, 가족들의 먹거리인 농작물의 생산과정까지 꼼꼼히 챙긴다. 유기농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쉽게 떠올리지만,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는 흙을 살려서 환경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건강한 밥상,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농작물 생산의 필수요소가 바로 환경이다. 깨끗한 농업환경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필수 기본요소다.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선 깨끗한 토양·공기·물과 건전한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가렛 하딘(Garrett Hardin) 교수는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자원을 시장 기능에 맡겨 두면, 사적으로 남용해 자원이 오염되고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사이언스지 논문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공공제적인 성격을 가진 농업환경은 깨끗하게 관리돼야 하는 대상이고, 개인의 적극적 관심 뿐 아니라 공공단체 또는 국가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은 자연과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해 환경파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농작물 재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관리와 대비는 필수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 역시 불볕더위에 한파, 4월을 바라보는 이 때 눈을 보는건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런 탓에 곡물 자급률은 점점 낮아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5.3%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농업 역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농업의 녹색성장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하며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농업생산성을 유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 검출 사례는 환경관리에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에서도 방사성 제논이 극미량이지만 검출됐다. 꽤 오랫동안 토양에 잔류해 작물을 오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슘137’과 마찬가지로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 중 하나인 방사성 제논은 미량이라도 사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와 농업환경의 특별한 관리가 시급하다.
환경관리를 위한 에너지 투입. 즉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양만 사용하고, 도시생태계 또는 공장에서 유입되는 환경오염 물질(중금속, 유기성유해화합물 등)을 차단해야 한다. 택지개발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토양의 침식과 유실을 막아 토양을 보전해야한다. 농업환경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수치인 380ppm 또는 그 이하가 되게 해 쾌적한 대기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물은 이산화탄소를 영양원으로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능이 좋은 작물을 개발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높여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완충능을 높여야한다.
농업생산성과 농업환경 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 오염물질로부터 깨끗한 농업환경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농업생태계를 유지·보전할 때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후손에게 좋은 농업자원을 물려 줄 수 있다.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가능하다. 단순한 親환경을 넘어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생태계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가꾸어 가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가야하는 중요한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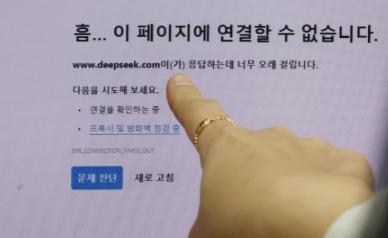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